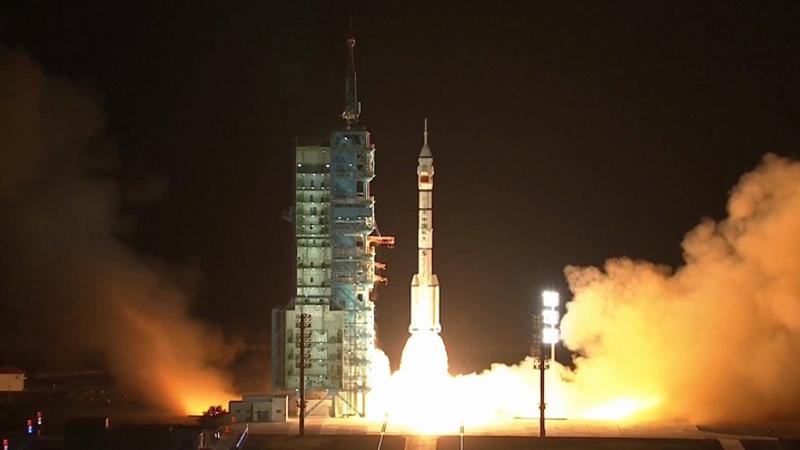(영화 "그린북" 자료사진)
지난해 영화관에서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보고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셜리와 백인 운전기사 토니 발레롱가 두 사람이 이룬 이색적인 조합, 미국 남부공연을 다니면서 둘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인종을 초월한 진실한 우정을 쌓아간다.
영화의 배경은 지난 세기 60년대 미국 남부지방이고 그 당시는 인종차별시가 유난했다. 흑인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과 머무를 수 있는 호텔이 엄격하게 지정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징벌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적은 안내서가 바로 “그린북”이다.
영화에서는 돈 셜리가 마지막 공연을 호텔에서 성공리에 마쳤으나 식사는 백인들과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홀로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온다.
이른바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돈은 천당과 지옥을 한꺼번에 오간 셈이다. 주인공의 울분과 무기력함이 고스란히 전해오고 이런 흑백 논리의 제도에 대한 혐오가 들었던 느낌이다.
60년이 지난 지금, 미국사회는 백인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을 발단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 와중에 과잉진압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흑백모순때문에 미국 사회는 폭동이나 시위가 발생한 선례가 여러차례 있다.
그럼에도 이런 사건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은 고질적인 병폐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린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일부 사람들의 “색안경”은 아직도 차별을 만들어낸다.
피부색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결정짓는 것도 아니다.
그들 역시 평험한 이웃이고 직장동료이고 우리의 친구들이다.
“그린북”의 마지막 장면에서 돈 셜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토니네 집을 찾아간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순간이 관객들에게 큰 울림과 공감을 준다.
“그린북”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화합과 포용이다.
바로 지금의 미국과 나아가서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출처: 조선어부 논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