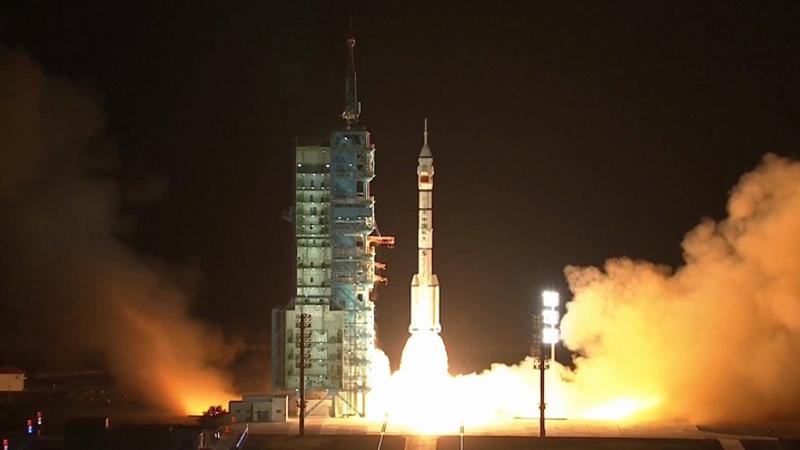(사진설명: 장자의 저서)
제2회 꿈에 사귄 해골
한 번은 장자와 그의 제자가 조(趙)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넓은 단풍 나무 숲을 지나다가 하늘 높이 치솟은 거목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나무는 열 몇 사람이 둘러서도 그러안을 수 없을 정도로 가지가 굵고 수관은 더욱 엄청나게 넓었다.
장자의 제자가 벌목원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제일 큰 이 나무를 베지 않습니까?”
“이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 나무로 배를 만들면 쉽게 썩고 문을 만들면 수지(樹脂)가 마르지 않으며 기둥으로 쓰면 벌레가 낍니다. 이 나무는 쓸모가 없기에 몇 천 년을 살아 이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벌목원의 말에 장자가 제자에게 말했다.
“보았느냐? 이 나무는 쓸모가 없기에 몇 천 년을 살 수 있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 나무는 무용지물이지만 쓸모 없음이 이 나무 자신에게는 큰 쓸모인 것이다. 자신이 장수할 수 있는 쓸모 말이다.”
장자의 그 말에 제자는 깨달은 바가 많았다.
장자가 말을 이었다.
“나무는 쓸모가 없기에 벌목의 난을 피하고, 이마가 하얀 소나 이마가 내려 앉은 돼지는 불길한 것이라 인정되기에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지 않으며,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징집을 피할 수 있기에 천수를 누릴 수 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를 빌어 자신의 명을 구할 수 있으니 하물며 덕과 재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더욱 그러하다!”
제자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말했다.
“즉, 산에 자란 나무는 쓸모가 있어서 벌목을 당하고 유지(油脂)는 연소를 통해 조명으로 쓸 수 있어서 추출을 당하며 계피는 향이 좋고 식용이 가능하기에 사람들이 모두 잘라 가져가네요! 또 옻나무는 즙이 쓸모가 있어서 껍질이 벗겨지고 사람들에게 즙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쓸모 있는 부분만 알지 쓸모 없는 부분의 더 큰 쓸모는 알지 못합니다.”
장자와 제자는 숲을 나와 한 지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 열정적인 지인은 아들을 시켜 거위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게 했다.
지인의 아들이 부친에게 물었다.
“한 마리는 울 줄 알고 한 마리는 울 줄 모르는 두 마리 수컷 중에 어느 거위를 잡을 까요?”
부친이 대답했다.
“물론 울 줄 모르는 거위를 잡아야지.”
밤이 되자 장자의 제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아름드리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벌목을 당하지 않고 장수했는데 거위는 쓸모가 없음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으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하겠습니까?”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 사이에 있으면 된다. 큰 도리에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사이에 있는 것과 같다. 단, 이렇게 살면 구속과 피곤함을 느낄 것이다.”
장자는 말을 끊고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자유자재로 노닐면서 영예도 치욕도 개의치 않으며 이로울 때는 용처럼 하늘을 날고 불리할 때는 뱀처럼 칩거할 수 있으면 된다. 고정불변을 고집하지 말고 순리를 따라야 한다. 단, 만물의 본성과 사람들의 습관은 다르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다. 모나고 예리하면 마모되기 마련이고, 고귀하고 권세가 높으면 무너지기 마련이다. 유능해도 피해를 받을 수 있고 현명해도 계략에 넘어갈 수 있으며 또 무능하면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따라서 그래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느니라. 알았느냐?”
제자가 스승의 말을 받았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새처럼 정해진 거처가 없이 세상을 집으로 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까? 또 새처럼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먹고 배를 불리는 것을 말합니까? 또 새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자유자재로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까?”
장자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렸다.
어느 날, 장자는 여윈 말을 타고 불어오는 서풍을 맞받아 창망한 고도(古道)를 걷고 있었다. 기러기 소리 사라진 가운데 곳곳에 해골이 깔려 참혹한 전란이 휩쓸고 지나갔음을 말해주었다.
장자는 잠깐 쉬었다 가려고 말에서 내려 여윈 말을 고목에 맸다. 그러자 나무를 감싸 안았던 칡덩굴이 바르르 떨어 그 바람에 나무에 깃들었던 새 몇 마리가 놀라서 우짖었다. 장자가 말라버린 풀더미를 밟자 그 속에서 해골 하나가 굴러 나왔다. 장자는 그 해골을 손에 받쳐 들고 벗과 마음을 나누듯 물었다.
“선생은 어쩌다 이렇게 되셨소? 병에 걸려 죽었소 아니면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삶을 마감했소? 그것도 아니면 칼을 맞아 죽은 것이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오? 혹은 동사(凍死)나 아사(餓死)이시오? 아니면 천수를 다 누리신거요?”
장자가 묻기를 마치니 들리는 것은 휙~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우수수~ 하며 바람에 낙엽이 날리는 소리뿐이었다. 장자는 길게 탄식하고나서 해골을 베개 삼아 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야심한 밤, 장자가 꿈을 꾸니 해골이 찾아왔다.
해골이 장자에게 말했다.
“선생, 금방 선생의 말을 들으니 억양은 변사(辯士)의 어투이고 묻는 것도 모두 살아 있는 사람이 걸머진 속세의 짐이군 그려. 사람이 죽으면 그런 짐 따위는 없어지니 죽은 뒤의 즐거움을 한 번 들어보시겠소?”
장자는 잠꼬대를 하듯 대답했다.
“물론이오. 말해보시오.”
해골이 말을 이었다.
“사람이 죽으면 군주도 없고 신하도 없고 사계절도 없이 천지(天地)를 춘추(春秋)로 삼아 여유롭게 도처로 떠돌아다니니 제왕의 즐거움도 이와는 비교가 안 되오.”
장자가 그 말을 믿지 못하 듯 물었다.
“만약 염라대왕이 당신에게 환생을 명해 뼈와 피부, 부모와 아내, 가족과 벗을 돌려준다면 받으시겠소?”
해골이 괴로운 기색을 띠더니 대답했다.
“내가 어찌 제왕의 즐거움을 버리고 속세의 노고를 다시 겪겠소?”
놀라서 잠에서 깬 장자가 하늘가에 걸려 있는 흐릿한 달을 쳐다보고 해골의 말을 떠올리니 솟구치는 즐거움을 억누를 수 없었다.
“살아서 무슨 즐거움이 있고 죽는다고 한들 무엇이 두려울까? 하하하!”
(다음 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