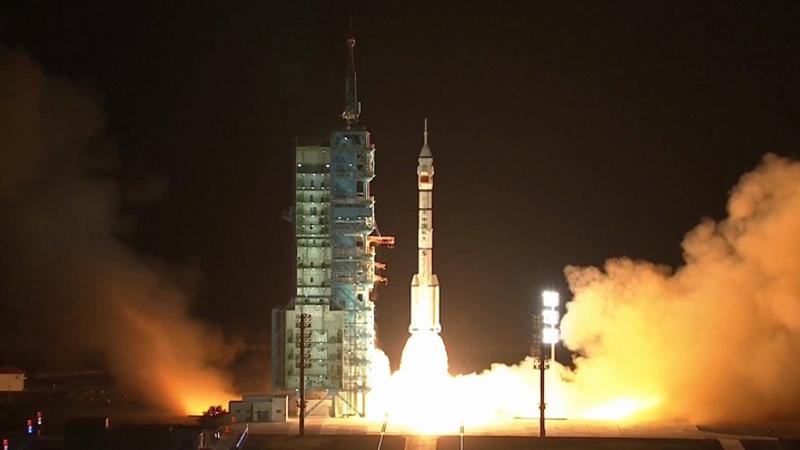제3회 자유분방한 산수시인
못에 잠긴 용은 그윽한 자태 뽐내고(潛虯媚幽姿)
하늘에서는 기러기 울음 소리 들려오는데(飛鴻響遠音)
하늘 가까이 다가서자니 기러기에게 미안하고(薄霄愧雲浮)
시냇가에 머물러 있자니 규룡에게 부끄럽네(栖川怍淵沈)
덕망을 펼치자니 지혜가 부족하고(進德智所拙)
물러나 밭을 갈자니 힘이 부치는데(退耕力不任)
봉록을 쫓다 도리어 궁벽한 바닷가로 와서(狥綠反窮海)
병상에 누워 빈 숲을 바라보고 있도다(臥㢌對空林)
이부자리 속에서 시절을 알지 못하다가(衾枕昧節候)
잠시 일어나 바깥세상을 엿보며(褰開暫窺臨)
귀를 기울여 물소리도 들어보고(傾耳聆波瀾)
눈을 들어 험준한 산줄기도 바라본다(擧目眺嶇嶔)
초봄의 햇살은 남아 있는 찬바람 물리치고(初景革緖風)
새 볕은 오랜 음지를 따스하게 바꾸는데(新陽改故陰)
연못가엔 푸릇푸릇 봄 풀이 돋아나고(池塘生春草)
정원 버드나무에는 새 소리가 달라졌네(園柳變鳴禽)
빈풍의 칠월을 노래 부르며 상심하다가(祁祁傷豳歌)
초사의 초은시를 생각하며 감상에 빠져보나니(萋萋感楚吟)
홀로 있으매 세월이 긴 것이 쉽사리 느껴지고(索居易永久)
무리를 떠나 있는지라 마음을 안정시키기 어렵도다(離群難處心)
지조를 지키는 게 어찌 옛사람에게만 있으리오(持操豈獨古)
번민 없는 삶의 증거가 여기에도 있도다(無悶徵在今)
임해(臨海) 태수(太守) 왕수(王琇)는 사령운의 산수시(山水詩) <지상루에 올라(登池上樓)>를 읊으며 마음이 더없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간 유행되어 온 현묘하기 그지없는 현언시(玄言詩)에 마음이 답답했는데 맑은 바람처럼 불어온 사령운의 시를 보니 대뜸 정신이 맑아진 것이다.
이 때 숲을 관리하던 한 아전이 황급히 달려왔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몇 백 명 되는 산적들이 떼를 지어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수가 놀라서 물었다.
“어디서 온 산적들이란 말이냐? 이 벌건 대낮에 감히 나무를 베다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전의 말에 왕수는 더 놀랐다.
“산중에서 나오다니? 야인들이라는 말이냐?”
“야인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갓을 쓰고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었으며 발에는 굽이 있는 나막신을 신었는데요.”
잠깐 멍하니 생각에 잠겼던 왕수가 갑자기 무언가 깨닫고 웃으며 말했다.
“알겠다. 산적이 아니다. 야인은 더욱 아니다. 필연코 산수를 즐기는 사강락(謝康樂) 나리실 것이다. 그는 외출할 때면 몇 백 명의 수종을 거느리고 산을 만나면 산을 쪼개고 숲을 만나면 나무를 베면서 심심산중의 바위만 찾아 다니느니라. 그가 신는 등산화는 산을 오를 때는 앞쪽 부분을 잘라 버리고 산을 내릴 때는 뒷굽을 버린다고 하느니라. 사람들은 그 신발을 사공극(謝公屐)이라고 부르지. 놀기를 좋아하는 이 나리는 매일 산중을 돌아다니기에 그렇게 많은 산수시를 지으시는 거다. 어땠느냐? 네가 본 사람이 이런 나리가 맞더냐?”
“맞습니다. 나리. 앞장에 선 사람이 수를 놓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어서 이상하다 했더니 원래 사강락 나리셨군요.”
“그렇다면 그냥 두거라. 이 나리는 돈이 많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거라.”
그날 저녁 왕수는 객사(客舍)로 찾아가서 사령운을 만났다. 사령운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시녕(始寧)의 남산(南山)에서 출발해 시냇물을 따라 나무를 베며 겨우 여기 임해에 도착했는데 여기 바위산이 있습니까? 있다면 계속 길을 내며 거기로 가서 등반을 해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여기는 바위산이란 없는 곳입니다. 바위산은 회계(會稽)에나 있지요. 회계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왕수의 대답에 사령운이 말을 이었다.
“회계산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갈수 있지요.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니 말입니다. 암석등반은 참으로 재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령운은 왕수를 위해 “이 곳은 지세가 험준하고(邦君難地嶮) 나그네들은 산행을 즐기네(旅客易山行)”라는 시를 즉흥적으로 지어 주었다.
수백 명의 수종을 거느리고 회계로 떠난 사령운의 행렬은 여전히 호호탕탕했다. 그들은 회계에 이르러서도 나무를 베어 길을 만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회계 태수 맹의(孟顗)가 경건한 불자가 아니라고 우습게 알던 차에 그가 찾아오자 사령운은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
“불자는 깨달음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나리께서는 제가 죽기 전에 세상을 뜨시고 성불은 저보다 늦게 하실 것입니다.”
사령운의 말에 맹의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그락푸르락했다.
사령운은 왕홍지(王弘之)와 함께 천추정(千秋亭)에 가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알몸으로 오가며 나뭇가지를 꺾어 붓으로 삼고 정자 기둥을 종이로 삼아 시를 쓰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맹의는 이는 예교(禮敎)를 벗어난 것이고 선비로서 체통이 말이 아니라고 여겨 사령운에게 권고하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사령운은 맹의의 편지를 보지도 않고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이렇게 알몸을 좋아하고 야단법석을 떨기를 좋아한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하고 무슨 관계냐!”
사령운이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고 거침이 없는 것은 그럴 능력이 있어서이다. 그가 천추정 기둥에 갈겨 쓴 산수시를 보면 그의 능력을 알 수 있다.
봄이 오니 파릇파릇 풀이 무성하고(萋萋春草生)
왕손과 공자들 잔디밭에서 뛰노네(王孫遊有情)
새끼 제비들 하나 둘씩 하늘을 날고(差池燕始飛)
복사꽃 봉우리 부끄러움 타는 소녀인 듯(天裊桃始榮)
산뜻한 꽃잎 화사함을 드러내고(灼灼桃悅色)
새끼 제비들 지지배배 우짖네(飛飛燕弄聲)
지붕 위로는 구름이 흘러가고(檐上雲結陰)
산간에는 바람이 시냇물을 흔드는데(澗下風吹淸)
울창한 숲에 새로운 빛이 드러나(幽樹雖改觀)
어린 싹 봄 기운을 알리네(終始在初生)
담쟁이 덩굴 소나무 가지에 기어오르고(松茑歡蔓延)
칡덩굴 얽힌 나뭇가지 무성함을 보이는데(樛葛欣蔂縈)
이 한 몸 홀로 세상을 떠돌며(眇然遊宦子)
언제 다시 벗들을 만날지 모르겠네(晤言時未幷)
봄기운에 콧등이 찡해나고(鼻感改朔氣)
아름다운 경치에 눈이 젖어 드네(眼傷變節縈)
벗을 멀리 떠나 소식도 없으니(侘傺岂徒然)
어찌 헛된 마음 들지 않으리오(澶漫絶音形)
봄바람에도 그리움 기탁할 길 없고(風來不可托)
날아가는 새도 어이 안부를 전하랴(鳥去岂爲廳)
<비재행(悲哉行)>이라는 제목의 이 시는 봄날의 경치를 묘사하는데 많은 시구를 할애해서 독자들은 사령운의 이 시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듯 생기발랄한 자연을 느끼다 보니 오히려 시인의 슬픔은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산수시의 매력이리라.
(다음 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