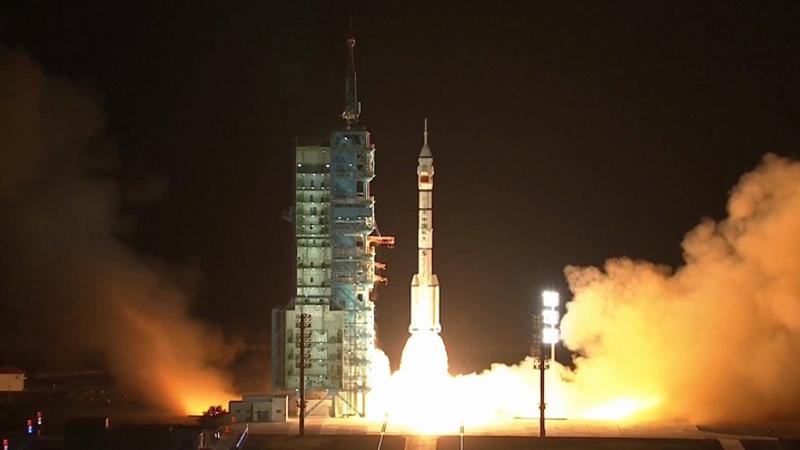(사진설명: 두보의 동상)
제3회 벼슬을 하며 시를 쓰다
두보는 자신이 이백(李白)에게 써준 ‘재능 있는 사람의 운수는 그다지 좋지 않고(文章憎命達) 도깨비는 사람들의 과오를 보며 즐거워한다(魑魅喜人過)’는 말이 자신의 참언이 될 줄을 몰랐다.
안사의 난이 폭발한 후 당현종(唐玄宗)이 사천(四川)으로 도망가고 장안(長安)은 곧 반군에 함락되었다. 지덕(至德) 원년(元年, 756년) 당숙종(唐肅宗)이 영무(靈武)에서 보위에 올랐다. 군주에 충성하는 두보는 가족을 부주(鄜州)의 강촌(羌村)에 안치한 후 곧 황제가 있는 영무로 향했다. 하지만 도중에 안록산(安祿山)의 반군에 잡혀 장안으로 끌려갔다. 자유를 잃고 험악한 처지였지만 두보는 매일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백성의 고통을 가슴 아파했으며 멀리 있는 가족을 그렸다.
천하에 대란이 일어나니 나라는 망하고 가족은 흩어져 죄 없는 백성이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었다. 하늘의 달은 인간세상의 질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밤하늘에 떠서 밝은 등처럼 대지를 환히 비추었다. 달빛아래 홀로 군영을 거니는 두보는 멀리 강촌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을 그렸다.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지만 서로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니 두보는 만감이 교차했다. 머리 들어 달을 바라보니 두보는 자신의 영혼이 산과 강을 넘어 강촌의 아내와 아이들 눈앞으로 날아가는 듯 느꼈다. 그는 멍하니 달을 바라보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보는 듯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친의 그리움을 알지 못하는 듯 이리저리 누워 달게 잠자고 있었다.
아아, 밤은 깊고 밤안개는 몽롱해 하얀 달빛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여보, 당신 귀밑머리에 안개가 내렸소. 당신 팔이 차갑지는 않소? 두보는 사랑하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글썽한 것을 보고 눈물을 닦아주려고 손을 뻗쳤다. 그 때 갑자기 호각소리가 들려와 두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는 키 높은 담벽이 막아서고 허름한 방안에는 어두운 등불이 가물거리고 있었다. 자신은 강촌이 아닌 장안에 있었다! 두보는 “아아, 원래 금방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나와 강촌에 갔었구나”라고 생각했다.
창문으로 비쳐 들어온 달빛을 빌어 두보는 가물거리는 등불 아래서 오언율시(五言律詩) <달밤(月夜)>을 썼다.
오늘 밤 부주에 뜬 달을(今夜鄜州月)
규중에서 당신 홀로 바라보고 있으리라(閨中只獨看)
멀리서 어린 아이들을 가여워하나니(遙憐小兒女)
장안을 생각하는 당신 마음 알까(未解憶長安)
밤안개에 구름 같은 쪽 찐 머리 젖고(香霧雲鬟濕)
맑은 달빛 아래 고운 팔이 차가우리(淸輝玉臂寒)
언제 비어 있는 휘장에 나란히 기대어(何時倚虛幌)
함께 달빛 밟으며 눈물 자국 말릴까(雙照漏痕乾)
붓을 놓고 짚을 깐 방 귀퉁이 바닥에 앉아 ‘언제 비어 있는 휘장에 나란히 기대어(何時倚虛幌) 함께 달빛 밟으며 눈물 자국 말릴까(雙照漏痕乾)’라고 생각하니 두보의 두 눈에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 내렸다.
다행히 당시 두보는 크게 유명하지 않았고 나이도 든 노인이라 반군은 곧 두보를 풀어주었다. 두보는 자유의 몸은 되었지만 장안성을 나갈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해 여전히 장안을 떠날 수 없었다.
고도(古都) 장안은 원래 얼마나 웅장한 기세를 자랑했으며 황금빛으로 눈부신 궁전은 또 얼마나 장관이었던가? 길고 넓은 거리는 얼마나 깨끗하고 가게들은 또 얼마나 즐비했던가? 또 거리와 가게들은 매일 오고 가는 인파로 가득했었으며 저녁이 되면 은은한 음악소리 울리는 건물들이 또 다른 고귀함을 나타냈었다. 그런데 오늘날 두보가 홀로 장안성을 거닐며 보니 곳곳의 담벽이 무너지고 도처에 잡초만 가득했다. 봄이 오니 성안의 잡초는 허리까지 자라고 길가에 핀 들꽃은 유랑민들의 눈물인 듯 했으며 깨진 기와 위를 날아 오르는 새들의 울음소리는 마냥 슬프기만 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두보는 더욱 슬픔을 느껴 “성밖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멀리 강촌에 있는 가족은 전혀 소식이 없구나. 누가 나에게 가족의 서신을 전해주겠는가? 장안이 함략된지 이미 5,6년이 지났지만 관군은 여전히 반군과의 싸움에서 패전을 거듭한다. 재상 방관(房琯)이 장안을 되찾을 큰 뜻은 가지고 있지만 잃은 땅을 다시 찾는 재능은 갖추지 못해 병거로 기병과 싸우다 반군이 병거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크게 패하고 퇴각했다. 반군이 이렇게 싸울수록 관군은 패하기만 하니 어찌 원망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두보는 참을 수 없는 두통을 느껴 손으로 머리를 두피를 눌렀다. 그러다가 두보는 비녀도 꽂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털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두보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다.
“늙어가고 있구나. 설마 나라가 태평해지는 그 날을 기다리지 못할 것인가? 설마 더는 아내와 자식들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인가?”
허름한 거처로 돌아온 두보는 만세에 길이 전해지는 유명한 오언율시 <춘망(春望)>을 썼다.
나라는 망해도 강산은 남아 있어(國破山河在)
봄맞은 장안성에 초목이 우거졌구나(城春草木深)
시국을 생각하여 꽃에도 눈물을 뿌리고(感時花濺淚)
이별이 한스러워 새소리에도 놀라네(恨別鳥驚心)
봉화가 오랫동안 연이어 오르니(烽火連三月)
집에서 온 편지 만금의 값이어라(家書抵萬金)
흰 머리는 긁을수록 더욱 짧아져(白頭搔更短)
거의 비녀조차 이기지 못하는구나(渾欲不勝簪)
‘부평은 바다로 흘러가기 마련이고 사람은 어디서라도 꼭 만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지덕 2년(757년), 두보는 유랑민을 따라 장안을 탈출했고 봉상(鳳翔)에서 고적(高適)을 만났다. 당시 숙종제가 봉상에 있었고 고적은 현종(玄宗)제의 제후왕 분봉(分封)을 반대한 것으로 인해 숙종제의 중용을 받아 회남(淮南) 절도사(節度使)로 임명되어 임지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적의 천거로 두보는 좌습유(左拾遺)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두보의 벼슬길은 고적처럼 탄탄대로가 아니었다. 벼슬길에 오른 두보는 고적처럼 점점 더 높은 벼슬을 한 것이 아니라 좌습유라는 자그마한 벼슬도 얼마 하지 못하고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 면직당했다. 두보는 황제로부터 벼슬을 빼앗긴 재상 방관(房琯)을 대변한 것으로 인해 집에 가서 친지를 방문하라는 어명을 받은 것이었다.
이 일은 좌습유 두보에게는 나쁜 일이지만 시인 두보에게는 좋은 일이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간 두보가 <강촌(羌村)> 3수를 썼음은 물론이고 위대한 현실주의 서사시 <북정(北征)>을 썼기 때문이다.
황제 제위 2년 되는 가을(皇帝二載秋)
윤 팔월 초하룻날 좋은 날씨에(閏八月初吉)
나 두보는 북으로 나아가(杜子將北征)
멀리 가족을 찾아보련다(蒼茫問家室)
아아,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維時遭艱虞)
조정과 민간에 한가한 날 드물구나(朝野少暇日)
돌아보니 부끄럽게도 나만 은총 입어(顧漸恩私被)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 받았구나(詔許歸蓬蓽)
…
확실히 ‘재능 있는 사람의 운수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文章憎命達).’ 곽자의(郭子儀)가 장안을 수복한 후 숙종제와 태상황(太上皇)은 모두 장안으로 돌아갔다. 두보도 장안으로 돌아가 여전히 좌습유를 지냈다. 하지만 1년도 안 되어 두보는 화주(華州) 사공참군(司功參軍)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로부터 장안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다.
부임차 화주로 가던 두보는 지방관리들이 군사를 징집하고 강제로 장정을 징발하는 것을 보았고 또 신혼 다음날 군사로 징집된 신랑과 60세의 고령에도 전장으로 가는 노인, 또 다시 군복무에 나선 퇴역 군인을 보면서 사서에 길이 남는 시작들인 ‘삼리(三吏)’와 ‘삼별(三別)’을 썼다. ‘삼리’는 <신안리(新安吏)>와 <동관리(潼關吏)>, <석호리(石壕吏)>를 말하며 ‘삼별’은 <신혼별(新婚別)>과 <수로별(垂老別)>, <무가별(舞家別)>을 말한다.
(다음 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