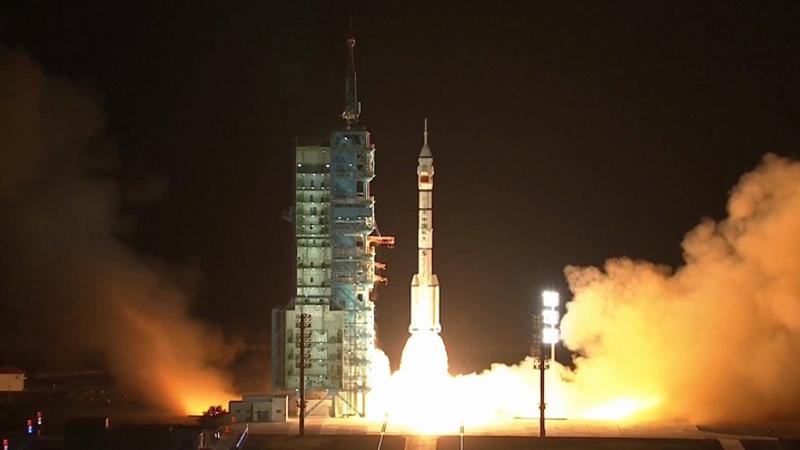(사진설명: 그림으로 보는 소동파)
제3회 좌천되어 명작들을 쓰다
오대시(烏臺詩) 사건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요행 살아서 황주(黃州)로 온 소동파는 정혜원(定惠院)에 거처를 두었다. 그리고 이 때의 소동파는 더는 하늘을 찌르는 큰 포부도 가지지 않고 격앙된 감정도 지니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그의 문풍도 서서히 변해갔다.
그날 밤, 조각달이 성긴 오동나무 가지에 걸렸다. 달빛은 서릿발 같이 쓸쓸하고 밤바람은 물처럼 차디찼다. 정원을 거닐던 소동파는 고요한 가을이 적막하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소동파는 갑자기 외로운 검은 그림자 하나가 떠도는 영혼처럼 오동나무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보았다. 아아, 원래 홀로 남은 외기러기가 차가운 오동나뭇가지를 골라보며 깃들려 하지 않고 있었다. 그 순간 소동파는 감동을 받았다.
“외기러기야, 너는 정말로 적막을 즐길지언정 타락하지 않고 세속을 따르지 않으며 굴복하려 하지 않는 나와 같구나!”
소동파는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격정을 느끼고 방안으로 들어와 외로운 등잔 밑에서 <복산자·황주정혜원우거작(卜算子·黃州定惠院寓居作)>를 썼다.
이지러진 달 성긴 오동나무에 걸리고(缺月卦疏桐)
밤이 깊어 물시계도 끊어지고 인적도 없네(漏斷人初靜)
은거자 홀로 오고 가는 것을 보았는가(誰見幽人獨往來)
마치 희미한 외기러기 모습 같은 것을(縹缈孤鴻影)
기러기 놀라 날아 오르며 머리 돌리지만(驚起却回頭)
그 마음 아는 사람 없어 한스럽네(有恨無人省)
차가운 가지를 골라보지만 깃들고 싶지 않고(拣盡寒枝不肯栖)
내려 앉으려니 적막한 모래톱 썰렁하네(寂寞沙洲冷)
소동파가 붓을 놓자마자 아내 왕씨(王氏)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애들이 내일 밭에 가서 기음을 맨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서 일찍 잠들었어요. 당신도 얼른 자요.”
“좋소.”
아내의 말에 이렇게 대답한 소동파도 자리에 누웠다.
침상에 누우니 창 밖의 달빛이 또 잠을 방해해서 소동파는 동생인 소철(蘇轍)을 생각했다.
“내가 감방에 갇혔을 때 하남(河南)에서 추관(推官)으로 있던 소철은 자신의 관직으로 나의 죄를 속죄하겠다는 소를 황제에게 올렸지 뭐야. 하지만 폐하께서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는 고사하고 그를 균주(筠州)로 좌천시키셨지. 아아, 희녕(熙寧) 9년(1076년) 추석에 서주(徐州) 지주(知州)로 있을 그 때 벌써 소철의 얼굴을 본지 7년이나 넘어 취중에 동생을 그리는 <수조가두(水調歌頭)>를 썼었지. 그 때는 다만 ‘사람에게는 슬픔과 기쁨, 만남과 이별이 있고(人有悲歡離合) 달은 어둡고 밝은 때와 둥글고 모자랄 때가 있으니(月有陰晴圓缺) 이런 일은 예로부터 완벽할 수는 없었지(此事古難全)’라고 생각하며 ‘그저 바라는 건 우리 인생이 오래도록 무탈하여(但愿人長久) 천 리 밖에서도 아름다운 달빛을 함께 보고픈 것 뿐(千里共嬋娟)’이라고 명월에 그리움을 기탁했었다. 그런데 우리 형제는 모진 고난을 다 겪으며 10년이 넘도록 만나지 못하다니? 또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구나. 인생에 몇 개의 십 년이 있겠는가? 아아,‘인생이란 무엇과 같은가(人生到處知何似) 기러기 날다 눈 내린 벌판에 잠깐 내리는 것과 같구나(應似飛鴻踏雪泥)! 철아, 우리 형제 언제면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소동파는 동생을 그리며 잠들었다. 하지만 그는 꿈에서 동생이 아니라 세상을 뜬지 15년이 되는 아내 왕불(王弗)을 보았다. 그녀는 창가의 거울을 마주하고 머리를 빗고 있었다. 소동파는 놀라서 또 잠에서 깼다.
“왜 또 이런 꿈을 꾼 거지? 5년 전에 밀주(密州)에서 <강성자·을묘년 정월 22일 밤의 꿈 이야기 (江城子·乙卯正月二十二夜記夢)>를 썼지.”
마음 속으로 그 글을 다시 되뇌며 꿈을 떠올리는 소동파의 눈에서 또 다시 눈물이 흘러 내렸다.
삶과 죽음으로 아득히 멀어진 십 년 세월(十年生死兩茫茫) 생각지 않으려 해도(不思量)
정말 잊기 어렵소(自難忘). 쓸쓸한 무덤은 천 리 먼 곳에 있으니(千里孤墳) 처량한 심정 호소할 데 없구려(無處話凄凉). 서로 만난다 해도 알아보지 못하리니(縱使相逢應不識) 얼굴에는 먼지 가득하고(塵滿面) 머리는 서리처럼 세었으니(鬢如霜).
어젯밤 꿈속에 홀연히 고향에 돌아가니(夜來幽夢忽還鄕) 당신은 작은 창가에서(小軒窓) 마침 화장을 하고 있었지(正梳妝). 서로 바라보며 말도 못하고(相顧無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소(惟有淚千行). 해마다 애간장 끊어지는 곳은(料得年年斷腸處) 달 밝은 밤(明月夜) 작은 소나무 늘어선 언덕이라오(短松崗).
소동파는 창 밖의 달을 바라보며 또 생각에 빠졌다.
“아내를 모친의 곁에 묻었으니 그들 고부간이 이웃하며 외롭지는 않을 테지? 내가 심은 소나무도 이제는 푸른 숲을 이루었겠지!”
소동파의 지금의 아내 왕윤지(王閏之)는 작고한 아내의 사촌 여동생이다. 그녀는 사촌 언니가 낳은 아들 소매(蘇邁)도 성인으로 키웠고 또 소태(蘇迨)와 소과(蘇過) 두 아들도 낳았다. 깊게 잠든 아내를 바라보는 소동파의 마음 속에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가득 찼다.
“오대시(烏臺詩) 사건으로 내가 4개월간이나 감방에 갇혀 있어 당신이 고생 많았소. 당신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벌써 감방에서 죽었을 것이오.”
날이 밝았다. 소동파와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황주성을 나가 동쪽 언덕의 콩밭에서 풀을 뽑고 물을 주었다. 두 아들은 풀을 뽑으면서 도연명(陶淵明)의 시 “남산 아래 콩을 심었으나(種豆南山下) 풀만 무성하고 콩 싹은 드무네(草盛豆苗稀). 새벽에 일어나 거친 밭 매고(晨興理荒穢) 달과 함께 호미 메고 돌아오네(戴月荷鋤歸)…”를 읊었다.
“이 분이 없이 어찌 하루인들 지낸 수가 있겠는가(何可一日無此君)!”
언덕에 대나무 몇 그루를 심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린 소동파는 백거이(白居易)의 시 <보동파(步東坡)>를 읊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쪽 언덕을 걷고(朝上東坡步)
저녁에도 일 마치고 동쪽 언덕 걷는데(夕上東坡步)
어이하여 동쪽 언덕을 좋아하느냐면(東坡何所愛)
내가 이곳에 숲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지(愛此新種樹)
이 때 소과가 달려와 물었다.
“아버님, 동쪽 언덕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디가 동쪽 언덕이에요?”
“백거이가 말하는 동쪽 언덕은 충주(忠州) 성 동쪽에 있고 우리의 동쪽 언덕은 바로 이 곳이다.”
소과의 질문에 답한 소동파는 이번에는 아내를 향해 물었다.
“나의 호(號)를 동파거사(東坡居士)라고 짓고 싶은데 당신 보기에 어떻소?”
남편이 백거이를 가장 우러르는 것을 잘 알고 그 남편이 지금 또 백거이처럼 좌천되었으며 백거이와 마찬가지로 성의 동쪽에 나무를 심는 것을 본 왕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백거이가 그 호를 쓰지만 않았으면 당신이 쓰세요!”
이때 소과가 끼어들었다.
“아버님의 호가 동파거사라면 저는요?”
“이제 네가 성인이 되면 네 마음대로 호를 지을 수 있다. 그건 내가 대신할 수 없는 네 자신의 일이다.”
소동파의 말에 모두들 즐겁게 웃었다.
황주에서 소동파는 아주 적은 봉록을 받았다. 그리하여 성밖에 콩을 심어 생계에 보탰다. 살림은 빠듯했지만 한 가족은 화목하고 즐겁게 살아갔다. 소동파는 농부들과도 사귀고 관아의 아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늘 몇몇 지인들과 함께 산수 속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동파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전하는 많은 명시를 썼다.
또 달 밝고 바람 맑은 밤이 되자 소동파는 아름다운 달빛을 차마 저버리지 못해 하얀 달빛을 밟으며 자신처럼 귀양을 와서 승천사(承天寺)에 머무는 벗 장회민(張懷民)을 찾아갔다. 그리고 <밤에 승천사에서 노닌 것을 적다(記承天寺夜遊)>를 썼는데 이 작품은 후에 화가들이 너도 나도 그림으로 그린 내용이 되었다.
원풍 6년 10월 12일 밤에(元豊六年十月十二日) 옷을 벗고 잠을 자려다가(解衣欲睡) 달빛이 창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와(月色入戶) 흔연히 일어나 거닐었다(欣然起行). 함께 즐길 사람이 없음을 생각하다가(念無與樂者) 승천사로 장회민을 찾아갔다(遂至承天寺尋張懷民). 회민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懷民亦未寢)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相與步於中庭).
정원은 달빛이 비쳐 맑은 물 같고(庭下如積水空明) 물 속에는 마름풀과 어라연이 이리저리 떠 있는 것 같았는데(手中藻荇交橫) 모두가 대나무와 잣나무의 그림자였다(盖竹柏影也).
어디엔들 저 달빛이 없으랴(何夜無月)? 어느 곳인들 대나무와 잣나무가 없겠는가(何處無竹柏)? 다만 우리 두 사람 같이 달빛 즐기는 한가한 사람이 없을 따름이지(但少閑人如吾兩人者耳).
소동파의 이 글은 짧지만 운치는 무궁해서 이 글을 읽고 나면 달빛 아래 그림 같은 경관을 보는 듯 하고 더욱이 초연하고 활달한 저자의 고요한 심경을 느낄 수 있다. 그리하여 후세 사람들은 ‘아름답기 그지 없으며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하다’고 이 글을 높이 평가한다.
어느 날, 소동파는 벗들과 함께 적벽산(赤壁山)에 올랐다. 세찬 물결을 이루며 동쪽으로 흘러가는 장강(長江)을 바라보니 언덕에 부딪친 물결이 하얗게 부서져 소동파 마음의 격정도 강물처럼 세차게 솟아 올랐다. 과거 적벽대전은 영웅들이 모인 전무후무의 인재의 모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어제로 사라지고 풍류인물들도 모두 강물처럼 흘러가버렸다. 유독 세차게 흐르는 저 장강만 남아서 여전히 쉬지 않고 흐르는 것이었다. 이에 소동파는 저도 모르게 “인생은 유한하고 강물은 무궁하구나! 인생은 꿈에 불과하구나!”라고 감탄하며 후에 최고로 호방한 사(詞)라는 평가를 받는 명작 <염노교·적벽회고(念奴嬌·赤壁懷古)>를 즉흥적으로 썼다.
강물은 동쪽으로 흐르고(大江東去) 천고의 풍류 인물들도 물결 따라 흘러갔네(浪淘盡千古風流人物). 옛 성의 서쪽을(故壘西邊) 사람들은(人道是) 삼국시대 주유의 적벽이었다고 말한다(三國周郞赤壁). 어지러운 바윗돌은 구름을 뚫고(亂石穿空) 성난 파도는 기슭을 부수어 버릴 듯(驚濤裂岸) 말아 올린 물결은 높게 쌓인 눈인 듯 하구나(卷起千堆雪). 강산은 그림과 같고(江山如畵) 한 때 얼마나 많은 호걸들이 있었던가(一時多少豪傑).
아득히 먼 옛날의 주유를 떠올리니(遙想公謹當年) 소교가 처음 시집왔을 때(小喬初嫁了) 영웅의 풍채가 당당했었네(雄姿英發). 깃털 부채에 선비 차림으로(羽扇綸巾) 담소하는 사이에(談笑間) 적의 배들은 재가 되고 연기가 되어 사라졌도다(檣櫓灰發煙滅). 그리운 마음에 그 곳으로 달려가면(故國申遊) 다정다감하다 나를 웃으리(多情應笑我) 벌써 백발이 되었다고(早生華發). 인생은 꿈과 같으니(人生如夢) 한 잔 술을 저 달에 바치노라(一尊還酹江月).
소동파는 그 후에도 달밤에 벗들과 배를 타고 적벽을 노닐면서 또 <전전벽부(前赤壁賦)>와 <후적벽부(後赤壁賦)>를 썼는데 모두 천고의 절창이 되었다. 후에 화가들의 작품 <적벽도(赤壁度)> 다수도 바로 소동파의 글에 따라 그린 것이다.
(다음 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