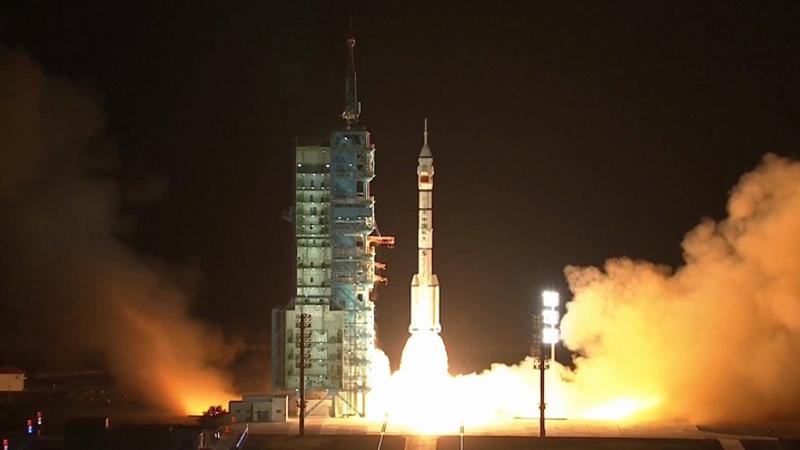(사진설명: 사령운 기념관)
제2회 벼슬을 내놓은 능력자
성격이 호탕한 사령운은 선천적으로 새롭고 기발한 주장을 제출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심지어 옷을 입고 모자를 쓰는 데서도 옛 형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령운이 새로운 양식의 옷이나 모자를 바꾸면 많은 사람들은 너도나도 그를 모방했다.
사령운은 화려하고 새로운 양식의 의상을 하고 다녔음은 물론이고 마차도 남다르게 단장했다. 그는 짐승의 뿔로 마차를 장식하고 말의 갈기를 땋기도 했다. 사령운이 고귀한 출신에 수려한 외모, 출중한 문장의 주인공이기에 사람들은 그토록 그를 숭배하고 따르고 모방했으리라.
당시 남쪽으로 이주한 명문가들은 분발해 북벌(北伐)할 의지는 없고 두고 온 고향을 그리기만 하면서 현학(玄學)만 논하며 이를 ‘명사의 풍류’라 자처했다. 이와 동시에 문단에도 텅 빈 내용에 시정이란 전혀 없는 현언시(玄言詩)가 난무했다. 현언시를 쓰는 시인들은 무슨 ‘멀리로는 장자와 노자를 읊고 허순도 나에게 감복한다’고 자화자찬했고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숭배했다. 심지어 동진(東晉)의 간문(簡文) 황제도 허순(許詢)의 현언시를 “참으로 기이하고 절묘하다”고 칭찬했다.
이 때 창의력이 넘친 사령운은 무미건조하고 텅 빈 현언시의 특징을 한눈에 꿰뚫어보고 화려하고 산뜻한 자신의 단장처럼 산수를 아름다운 시구로 바꾸어 시단(詩壇)에 참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영가는 산 좋고 물이 맑았으며 경치가 빼어났다. 영가 태수로 좌천되어 슬픔과 원망에 빠진 사령운에게 있어서 산수를 즐기며 시를 지어 읊는 것은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더는 공무를 보지 않고 산수만 즐겼으며 한 번 나가면 열흘씩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다반사였다. 또 외출할 때마다 그가 어느 산중에 들어갔는지는 누구도 몰랐고 누구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영가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람 사는 세상이라 사나흘에 한 건씩 백성들 간의 분쟁이 발생했고 3개월에서 5개월에 한 번씩은 인명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하지만 태수가 공무를 전혀 보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 관아도 지키지 않으니 사령운의 부하들만 죽어났다.
어느 하루, 태수의 막료인 사야(師爺)가 사령운에게 말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누군가 나리를 조정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신들은 나리가 우스개거리가 되는 것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럼 벼슬을 그만 두겠다. 그러면 되느냐?”
사령운은 즉시 사직서를 올렸다.
사씨 가문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분분히 서신을 써서 권고했다.
“너는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사씨가문을 좀 생각하거라. 지금은 진(晉) 나라가 아니다. 권신들은 우리 사씨 가문을 눈엣가시로 생각하고 제거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데 스스로 앞길을 끊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느냐?”
하지만 사령운은 문중 어른들의 권고도 무시하고 벼슬을 그만 둔 후 회계(會稽)로 가서 은둔을 준비했다. 그는 부친과 조부가 묻히고 사씨가문의 가업과 산장이 있는 회계의 시안현(始安縣)이 자신의 진정한 고향이라고 생각했다.
“뒤에 청산을 업고 맑은 물을 마주해서 수려하면서도 고요하네요. 이 곳의 경치는 정말로 좋습니다! 나는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 하겠습니다.”
사령운은 은자 왕홍(王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산장에 머물면서 가끔 은자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시를 읊으며 산수를 즐기거나 승려들과 함께 좌선하며 불교 교리에 빠지기도 했다. 사령운은 스스로 만족하는 기분 좋은 생활을 이어갔다.
사령운이 시(詩)나 부(賦)를 쓰면 하인이 즉시 그 작품들을 성안으로 보내 사람들이 서로 베끼며 전하는 바람에 금방 경성(京城)에까지 전해졌다. 명사들은 “산은 우뚝 솟은 봉우리가 끝없이 이어졌고(暗峭嶺稠疊) 강은 모래톱을 품고 구비구비 이어져 있네(洲縈渚連綿) 산에는 흰 구름이 검은 돌을 품고 떠 있고(白雲抱幽石) 강변 초록색 같대 밭에는 잔물결이 찰랑이네(錄篠媚淸漣)”와 같은 시구를 보면 혀를 차면서 감탄을 마지 않았고 또 너도나도 사령운을 따라 배워 산수를 즐기고 산수를 노래하는 시와 부를 창작했다.
산수시는 이렇게 유행되기 시작하며 점차 현언시를 대체했다. 사령운은 은둔한 것으로 인해 종적이 모연해진 것이 아니라 수려한 시구로 오히려 경성을 흔들었다.
정치는 항상 이상야릇하고 황당무계하며 변화무쌍하게 돌아갔다. 서헌지가 사람을 보내 송소제를 시해하자 소제의 셋째 동생인 유의륭(劉義隆)이 보위를 이어 받아 송문제(宋文帝)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송문제는 서헌지의 목을 자르고 사령운에게 비서감(秘書監) 벼슬을 내리며 경성으로 불렀다.
사령운이 승려와 은자들에게 물었다.
“가야 할까요 가지 말까요?”
한 은자가 말했다.
“진정한 은자는 조정에 숨습니다(大隱隱於朝). 가시지요!”
한 승려가 말했다.
“스스로만이 아는 일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물으시지요.”
그들의 말에 사령운이 대답했다.
“평생의 취미는 산수를 좋아하는 것이고 조정은 더러운 곳이라고 내 마음이 말하네요. 그럼 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이나 불렀지만 사령운이 모두 부름을 받지 않자 송문제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마다 모두 칭찬과 아첨을 좋아하니 이 오만한 자식에게도 한 번 써보자! 우리 유씨 가문은 출신이 미천해서 이런 문인이 조정에 들어올 필요가 있지 뭔가. 아아,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학문이 옅은 서민황제라고 비웃으니 참으로 체면이 서지 않는구나.”
광록대부(光祿大夫) 범태(范泰)가 표창장을 들고 찾아와 황명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장의 ‘곱고 아름다운 말은 고금에 없다’느니‘인근에서 우러르고 그 명성에 경성이 움찔한다’는 미사여구를 본 사령운이 우쭐해서 말했다.
“후의를 거절하기 어려우니 동산재기(東山再起)토록 하겠습니다. 하하, 이 동산재기는 우리 사씨 가문의 전용이 되었군요.”
과거 사령운의 숙조(叔祖) 사안(謝安)이 동산(東山)에 은거하다가 다시 벼슬을 받아 재기한 것으로 인해 동산재기가 사자성어가 되었던 것이다.
천하를 논하고 정치에 참여하려는 큰 뜻을 품고 사령운은 벼슬을 하러 경성으로 갔다. 하지만 황제가 그에게 문학과 사학에 관한 일만 맡길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송문제가 사령운을 보고 말했다.
“비각(秘閣)의 서적이 너무 난잡하고 빠진 부분도 적지 않으니 그대가 책임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보충할 부분은 보충하시오! 참, 그리고 진(晉) 나라는 이미 역사가 되었으니 우리 조정의 문인들이 <진서(晉書)>를 써야지 않겠소. 이 일이야말로 그대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소?”
송문제의 말에 사령운은 크게 실망했으나 어쩔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자료 정리를 시키고 자신은 <진서>를 편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령운은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진서>의 목록만 대충 만들어 놓고는 붓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서민황제야, 더는 네놈의 시중을 들지 않겠다!”
그로부터 사령운은 <진서>를 한쪽에 밀어두고 행서(行書) 서체의 서예연습에 빠졌다. 사령운의 모친은 서성(書聖) 왕희지(王羲之)의 외손녀였다. 그로 인해 도관에서부터 서예에 조예가 깊던 사령운은 15살에 집으로 돌아온 후 모친의 가르침으로 그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사령운이 관리의 업무에 매진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빠져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오히려 시중(侍中)으로 승진되고 그에게 내려지는 하사품도 끊이지 않았으며 점점 더 후한 예우를 받았다. 그것은 사령운의 시와 서예가 절묘하기 그지 없으며 신작이 나올 때마다 몸소 송문제에게 올렸기 때문이다. 송문제는 사령운의 신작을 받을 때마다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다.
“시도 좋고 행서(行書) 서체도 좋으니 과히 두 보물이라 할 수 있도다!”
송문제는 말로는 이렇게 사령운을 높이 평가했지만 진정으로 그를 중용하지는 않았다. 황제는 사령운을 문필에 능한 선비나 군주의 놀잇감 신하로 보고 황실에서 만찬을 차릴 때면 그를 불러 시중을 들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 읊으며 경치를 유람하게 했다. 그 뿐이 아니었다. 왕화(王華)와 은경인(殷景仁) 등 자신보다 명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요직에 올라 나랏일과 군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는 사령운은 심기가 아주 불편했다.
사령운은 또 다시 소극적으로 황제에게 대항하며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연못을 파고 담장을 쌓고 대나무를 심으며 자신이 맡은 업무도 보지 않았다. 심지어 가끔은 소도 올리지 않고 말미도 청하지 않은 채 수종들을 거느리고 먼 길을 떠나 산수를 즐기며 열흘이 넘어 돌아오기도 했다.
황제는 사령운을 빌어 체면은 세우고자 하면서도 그에게 실권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명문가 출신에 문학의 거두이며 명성도 저렇게 높고 능력도 있는 그가 실권을 장악하면 아마 이 강산의 주인이 또 바뀔 것이다.”
황제는 사령운이 너무 지나친 것을 알면서도 그의 체면을 깎지 않고 대신 이렇게 암시했다.
“과연 정말로 그렇게 벼슬이 싫으면 벼슬을 하지 않는 것도 홀가분하니 좋겠소.”
사령운은 황제가 자신이 스스로 벼슬을 내놓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아 듣고 두말 않고 소를 올렸다. 하지만 그는 소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북벌(北伐)해서 하북(河北)을 되찾게 해달라고 황제에게 간청했다.
그는 세속의 구애는 받지 않았으나 필경 사현(謝玄)의 손자였던 것이다!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울 소망이 가득했지만 그를 중용하는 사람이 없으니 산과 물에 기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 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