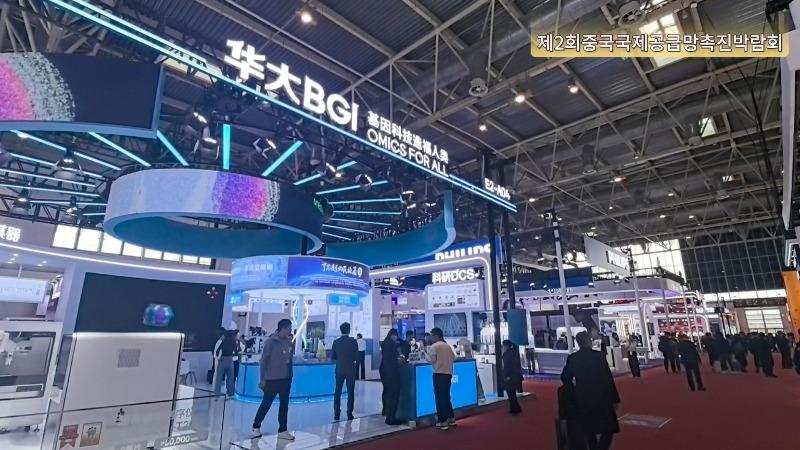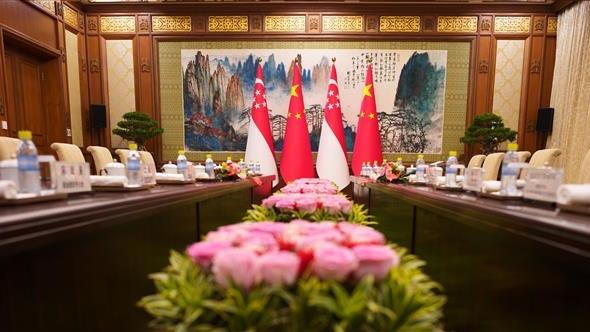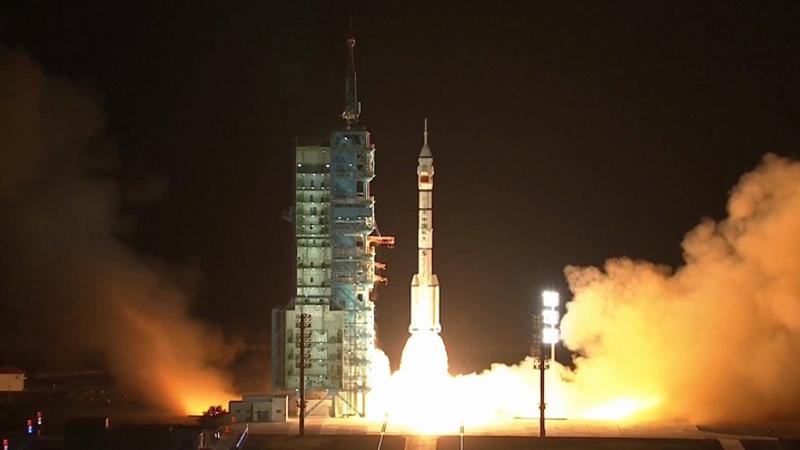(사진설명: 조설근 기념관의 일각)
제3회 산중에서 세상을 논하고 석두기가 선을 보이다
북경(北京)의 서쪽 교외, 향산(香山) 산중에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주변에 산봉우리가 높이 솟고 대숲이 무성하며 고요하고 황막해 이 곳에서 30리(里, 1리=0.5m) 밖에 있는 제왕의 도시와 천양지차를 이루었다. 청(淸) 나라 때 향산과 북경성은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었다.
조설근은 소설창작을 위해 정백기(正白旗) 인들이 모인 이 편벽한 산골마을에 정착했다. 하지만 아무리 천재적인 작가라 해도 매미처럼 바람과 이슬만 먹고 살 수 없었고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었다. 생각 끝에 술을 좋아한 조설근은 사마상여(司馬相如)와 탁문군(卓文君)처럼 마을에 작은 술집 하나를 차려놓고 술을 팔았다. 사마상여와 탁문군이 술집을 차린 것은 탁문군의 부친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조설근 내외가 술집을 차린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였다. 기인(旗人)들에게 내려오는 돈과 쌀만 가지고는 근본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술집이 문을 연 후 장의천(張宜泉)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한 사숙(私塾) 훈장이 자주 찾아오면서 술집의 단골이 되고 조설근의 벗이 되었다.
장의천은 조설근에게 늘 이렇게 질문했다.
“조 형은 왜서 이렇게 편벽한 곳에 와서 사는 거요?”
그 때마다 조설근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원래 숭문문(崇文門) 밖 산시구(蒜市口)에 살면서 우익종학(右翼宗學)에서 일했는데 얼마 전에 종학이 선무문(宣武門) 안의 융선(絨線) 후퉁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겠소. 우리 집과 거리가 너무 멀어 계속 종학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데다 생계도 해결하고 또 지금 쓰고 있는 <석두기(石頭記)>도 계속 쓰고 싶어서 이 외딴 곳으로 왔소. 여기에는 남방에서만 볼 수 있고 이 곳 경성에서는 보기 드문 푸르고 무성한 대숲이 있지 않소. 나는 유난히 이 대숲을 좋아하오.”
“그럼.‘이 분 없이 어찌 하루인들 살 수 있겠소(何可一日無此君)!’나도 대나무를 아주 좋아하오. 보아하니 우리는 심히 의기투합하는구려.”
어느 날 돈민(敦敏) 형제가 조설근을 찾아오고 장의천도 술을 마시러 왔다. 틈 나는 대로 몇몇 지기들과 모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고 만날 때마다 술도 빠지지 않았다.
그 날 조설근은 제대로 된 안주가 없자 가지를 맹물에 삶고 울타리에 피어난 호박꽃을 뜯어 볶으라고 아내에게 시켰다. 호박꽃잎을 안주로 술잔을 나누며 네 지기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를 읊기 시작했다.
조설근이 입을 열었다.
“장(張) 형은 불합리한 세상에 분노를 토로했구먼 그려. 이 건륭성세(乾隆盛世)에 ‘술 놀이를 싫다 하지 말라(莫厭飛觴樂) 오늘은 당 왕조가 아니니(於今不是唐),’‘정소는 진원이 아닐진대(亭沼非秦苑) 산천이 어이 한인 뿐이랴(山河詎漢家)’라는 시를 쓰다니 말이오. 설마 ‘산이 높아 황제가 멀리 있고(山高皇帝遠) 길이 멀어 따르지 않아도 된다(地遠不賓服)’고 생각하는 건 아니오? 이런 시를 썼다가는 목이 잘릴 수도 있는데 말이오.”
장희천이 말했다.
“이 심심산중에서 마음속 말을 해야 마음이 좀 시원하지 않겠소. 흥. 2천여 년 전의 옛 사람들도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이(防民之口) 강물을 막는 것보다 어렵다(甚於防川)’는 것을 알았는데 오늘의 현명하신 군주께서 이 이치를 몰라 이 태평성세에 지 아비나 할애비보다도 더 심하게 억압하니 말이오.”
“그만, 그만! 문자옥에 들 말을 그만 합시다. 피로 물든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는 시나 씁시다! 설근 형, 지난 번에 저에게 선물하신 <산석(山石)> 그림에 제가 시를 붙여봤습니다.”
돈민이 끼어들어 장의천의 말을 막고 자신이 쓴 시 <제근포화석(題芹圃畵石)>을 읊었다.
그대 같이 도도한 기골 세상에 드물고(傲骨如君世已奇)
그대 그린 바위는 더욱 기이하네(嶙峋更見此支離)
취중에 의기양양하게 붓을 날려(醉餘奮掃如椽筆)
마음 속 불평을 한껏 터놓네(寫出胸中碨磊時)
돈민이 시를 읊고 나서 말을 이었다.
“설근 형에 대한 이런 평가가 어울린다고 보세요?”
“조 형이 그린 그림은 삐쭉삐쭉한 바위가 기이하고 우뚝 솟은 험준한 봉우리가 조 형의 뛰어난 기골을 방불케 하는구려. 이 시도 참 잘 썼네. 잘 썼어! 이제부터 나는 조 형을 아예 석(石) 형이라고 불러야겠소.”
장의천이 돈민의 말을 받자 이번에는 돈성(敦誠)이 말했다.
“저도 시 한 수 썼어요. 혜강(嵇康)과 완적(阮籍)을 조 선생에 비유했는데 더 잘 어울릴 거예요.”
혜중산보다 더 게으르고(懶過嵇中散)
사나운 기세 완보병을 초과하네(狂於阮步兵)
시를 읊은 돈성이 말을 이었다.
“조 선생은 완적을 제일 숭배하고 술을 빌어 마음 속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조설근이 웃으며 대꾸했다.
“자네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다 좋네. 내 생각에 나는 술을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가 싶네. 하하하! 비바람 몰아치고 북풍이 뼈를 에이던 지난 번에 괴원(槐園)에서 자네를 만났던 때가 생각나는가? 그 때 술은 고프고 돈은 없고 해서 자네가 단도를 끌러서 술을 바꾸었지. 그 날 우리는 마음껏 술을 마셨고 나는 또 주흥을 빌어 자네에게 시도 지어 주었는데. 지금도 기억하는가?”
“그걸 어찌 잊겠습니까? 그 때 저도 시 한 수 지어 드렸는데요.”
조설근의 말에 돈성이 웃으며 대꾸하고 시를 읊었다.
순우 곤을 만난 듯 즐거워(相逢商況淳於輩)
한 섬의 술도 마실 수 있네(一石差可溫枯腸)
조자 웃으며 통쾌하다 하며(曺子大笑稱快哉)
돌을 두드리며 노래 부르네(擊石作歌聲琅琅)
돈성이 시에서 말한 순우 곤은 익살과 다변으로 유명한 전국(戰國) 시기 제(齊)나라 사람으로 ‘뜻이 맞는 사람과 자유롭게 마실 때 주량이 가장 크다’는 명언을 남겼다. 그리고 조자는 돈성이 스승인 조설근을 예를 갖추어 부른 호칭이다.
조설근은 돈성이 읊는 시를 들으며 맹물에 삶은 가지를 집어서 소금에 찍어 입에 넣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조설근은 감개무량해서 말했다.
“오늘은 맹물에 삶은 가지를 소금에 찍어 먹고 호박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과거 우리 집에서 가지를 먹을 때는 조리과정이 아주 복잡했네. 먼저 싱싱한 가지의 껍질을 벗긴 다음 잘게 썰어서 닭 기름에 튀겨내고 이어 닭 가슴살과 버섯, 죽순, 오향 건 두부를 넣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견과를 넣어 잘게 다지지. 그리고 나서 닭 탕을 넣어 뭉근히 끓인 후 참기름과 술지게미를 넣어 버무린 다음 질 그릇에 넣어 봉해 두고 먹을 때마다 꺼내서 볶은 닭고기와 함께 무침을 만들었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했네. 그러니 하늘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 가문을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겠지.”
“그렇게 많은 식재료를 넣고 그렇게 복잡한 조리과정을 거친 음식에서 가지 맛이 나겠어요? 부잣집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체면을 먹는 것뿐이에요. 매일 180가지 요리를 드시는 폐하께서 맛이 무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민의 말에 이어 장선천이 말했다.
“설근 형은 책에 세도가들의 그런 체면치레도 쓰오. 그래야 일반 백성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지 않겠소.”
“이 책에는 물론 몸소 겪은 일과 직접 본 여인들을 적고 우리 가문이 겪은 상전벽해의 변화도 모두 쓸 것이오. 다만 지금 문장을 엄격하게 통제하니 조금만 잘못 해서 참말을 하면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하고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르오. 그래서 나는 가어촌언(假語村言)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책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세상사람들의 슬픔을 덜어주려 하네. 아아, 가짜를 진짜로 보면 진짜도 가짜가 되고 (假作眞時眞亦假) 무가 유로 변할 때는 유도 다시 무가 되도다 (無爲有時有還無). 진짜와 가짜는 하나로 어울려 가리기 힘드니 독자들 스스로 가리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가어촌언(假語村言)’은 시골 사람의 말을 빌린다는 의미이며 가짜 이야기로 진짜 사실을 보여주려는 작가의 심경을 대변한다. 조설근은 또 <홍루몽>에서 소설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인물의 이름을 한자발음으로 ‘가어촌언(假語村言)’과 비슷한 가우촌(賈雨村)이라 달아 자신의 의도를 강조했다.
(다음 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