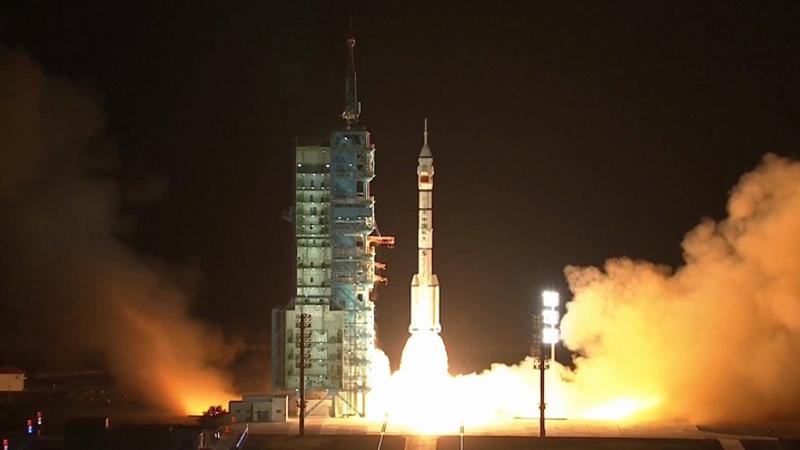(사진설명: 조설근의 석상)
제4회 지은이는 유감을 안고 떠나고 소설은 길이길이 전해지다
삭풍이 뼛속을 파고 들고 천지에는 함박눈이 펄펄 날렸다. 때는 건륭(乾隆) 연간 임오년(壬午年, 1762년)의 섣달 그믐날 저녁이고 장소는 청(淸) 왕조 도읍인 북경(北京) 성의 동쪽 통주(通州) 장가만(張家灣)에 위치한, 옛날 조(曺)씨 가문의 하인이었던 조삼(曺三)의 토담집이었다.
볏짚을 깐 침상의 낡은 이불 속에 몸을 옹송그리고 누운 조설근(曹雪芹)은 고열에 온 몸이 손을 대면 델 듯 뜨거웠지만 마음은 엄동의 날씨처럼 한 없이 시리기만 했다. 문밖에서 북풍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려와 조설근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함박눈을 보는 듯 했고 시흥이 일어 눈물을 흘리며 시를 읊었다.
이 몸 하늘을 받칠 재주가 없어(無材可去補蒼天)
속세에서 헤매기를 몇몇 해던고(枉入紅塵若許年)
전생 후생의 기구한 이 운명을(此系身前身後事)
누구의 손을 빌어 세상에 전하리오(倩誰記去作奇傳)
조설근은 조정의 추적과 빚쟁이를 피하기 위해 모두가 단란하게 모이는 그믐날 밤에 절친조차 거처를 모르는 과거의 옛 하인의 집에 몸을 숨긴 것이다. 흐리멍덩한 중에 조설근의 눈앞으로 지난 일이 환각처럼 흘러갔다.
몇 년간 이어진 가뭄으로 마실 마실 물도 없었으니 산중 마을에서 누가 술을 마시러 다니겠는가? 술집은 벌써 문을 닫았지. 생계가 끊긴 나는 부득이하게 미완의 <석두기(石頭記)>를 도서상인에게 팔았다. 결과 경성의 선비들은 너도나도 <석두기>를 읽으며 필사하고 감상했으며 황실 귀족들도 <석두기>를 화두로 열띤 논의를 벌이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필사본이 후궁에까지 전해져 심지어 황제와 비빈들도 <석두기>를 읽는 것을 유행으로 알았다.
건륭황제도 이 책을 아주 좋아해서 탁상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읽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하게 <석두기>를 위해 울고, <석두기>를 위해 웃는 비빈들을 본 건륭황제는 대로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이 <석두기>에 역모를 꾀하는 시가 있다! 반드시 엄격히 추궁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아야겠다. 흥. 벌주놀이 때 행주령(行酒令)에 ‘왼쪽에 두 점의 명(明), 오른 쪽에 두 점의 명(明), 공중의 두 일월(日月) 천지를 비추네’. 이게 무슨 말인가? 설마 하늘에 두 태양이 떠서 일월이 함께 밝기를 바라는 건가? 이건 다른 조정을 내와서 짐과 맞서려는 홍석(弘晳) 일당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글 쓴 자가 한인(漢人)이라면 명(明) 왕조 회복의 속셈이 있을 지도 모른다!”
건륭제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즉시 명령을 내렸다.
“<석두기>를 쓴 자가 도대체 홍석의 일당인지 멸망한 명의 유족인지 확실하게 조사하라!”
이 소식을 들은 돈성(敦誠)이 밤도와 달려와 알려주며 얼른 도망가라고 일렀다.
아아, 나는 애지중지 키우던 하나 밖에 없는 아들 녕(寧)을 천연두로 잃고 그 슬픔에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하지만 곧 설이 다가오는데다 빚쟁이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집에 있을 수 없어 아픈 몸을 끌고 이 편벽한 곳으로 왔지. 다행히 조삼이 옛날 주인집의 도련님이 이렇게까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가엾이 여겨 나를 받아주었다. 안 그러면 풍설 속에 아사자가 되었을 것이다…
몽롱한 꿈처럼 과거를 추억하는 조설근의 마음 속에는 슬픔이 끝없이 차 올랐다. 이런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 다만 금방 아들을 잃고 집에 홀로 남은 아내와 아직 다 못 쓴 <석두기>의 남은 28회를 생각하니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한탄했다.
“여보, 녕도 갔는데 나마저 가면 당신 혼자 이 세상에서 어찌 고생하겠소? <석두기>여, 그대는 홍루(紅樓)의 꿈에 불과한데 이렇게 큰 화를 불러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노라!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대를 이렇게 좋아하니 후세에도 그대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로다. 그러면 이 십 년 동안 기울인 나의 심혈이 헛되지는 않을 것이로다.”
조설근은 불처럼 뜨겁던 자신의 몸이 점차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시를 읊었다.
종잇장에는 온통 황당한 말이오(滿紙荒唐言)
그 속엔 서글픈 눈물이 어려있노라(一把辛酸淚)
다들 지은이를 바보라 말하지만(都言作者癡)
그 속의 참 맛 그 누가 알리오(誰解其中味)
시를 읊는 조설근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그는 가보옥(賈寶玉)과 임대옥(林黛玉), 사상운(史湘雲), 설보채(薛寶釵), 청문(晴雯)을 비롯해 자신의 심혈로 만들어진 책 속의 인물들이 줄지어 자신을 향해 걸어 오는 것을 보았다… 조설근은 자신의 영혼도 공중에 날아 올라 그 아름다운 인물들을 향해 날아가고 꿈에도 그리던 그 대관원(大觀園)으로 날아가는 것을 느꼈다…
그 해 조설근은 49살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쓴 소설 <석두기>가 <홍루몽(紅樓夢)>이라는 다른 책명으로 바뀌어 그의 사후 전국에 퍼졌으며 2백년 후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청(淸) 나라 때 득여(德輿)가 펴낸 시집 <경도죽지사(京都竹枝詞)>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시인이 <홍루몽>을 평하며 쓴 ‘말을 할 때 홍루몽을 언급하지 않으면(開言不說<紅樓夢>) 아무리 사서오경을 읽었어도 다 헛된 짓이라(讀盡詩書也枉然)’이다.
불후의 걸작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는 것이다. 이제 조설근은 저승에서 흐뭇하게 웃으리라.
번역/편집: 이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