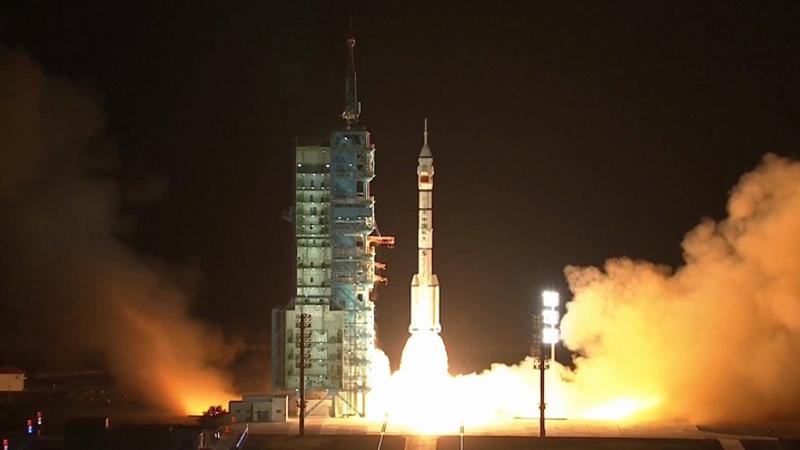(사진설명: 이백의 동상)
제2회 벼슬을 그만 둔 謫仙
광록대부(光祿大夫) 하지장(賀知章)과 장욱(張旭)이 장안(長安) 골목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나누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사명광객(四明狂客)과 장전(張顚)이라 자처하는 그들이 취기가 오르자 준비했던 종잇장을 들고 그들 앞에 다가가 글을 써달라고 했다. 하지장은 술기운에 일필휘지로 시를 썼는데 사람들은 문장부호도 없는 그 시를 보물로 여겼다. 장욱은 미친 듯이 서성이고 소리를 지르다가 신의 한 수인 듯 변화무쌍한 초서체(草書體)의 서예를 써서 장안의 일절(一絶)로 인정되었다.
그날 이백도 술을 마시러 왔다가 하지장이 기분이 좋은 기회를 봐서 급히 자신의 시작 <촉도난(蜀道難)>을 건넸다. 하지장이 받아 들고 보니 시는 종잇장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씌어있었다. ‘어허라(噫吁嚱) 험하고도 높구나(危乎高哉)! 촉도의 험난함이여(蜀道之難) 하늘에 오르기보다 어려워라(難於上靑天)’라는 첫 구절을 읽자 하지장은 손뼉을 치며 감탄했다.
“절묘하도다!”
그리고 시를 읽어내려 갈수록 점점 더 감동되어 마지막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소리 높여 읽었다.
검각은 삐죽삐죽 높기도 하여(劍閣崢嶸而崔嵬)
한 명이 관문을 지키면(一夫當關)
만 명도 못 당하고(萬夫莫開)
수문장과 친하지 않다면(所守或匪親)
승냥이와 다를 바 없노라(化爲狼與豺)
아침엔 호랑이 피하고(朝避猛虎)
저녁엔 구렁이 피하니(夕避長蛇)
이로 으깨고 피를 빨아(磨牙吮血)
사람 잡아 낭자하다(殺人如麻)
금관성이 좋다고 해도(錦城雖雲樂)
일찌감치 집으로 가느니만 못하리라(不如早還家)
촉도의 험난함이여(蜀道之難)
하늘에 오르기보다 어려워라(難於上靑天)
몸 기울여 서쪽 향해 긴 한숨만 쉬노라(側身西望長咨嗟)!
하지장은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감탄하며 시를 다 읊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분명 하늘의 적선(謫仙)의 작품인데 범부중생이 어이 이런 시를 써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로부터 사람들은 이백을 하늘에서 속세로 귀양을 온 신선이라는 의미로 적선이라 불렀다.
이백이 아직 관직이 없는 것을 안 하지장이 현종제에게 상소문을 올려 “이백과 같은 인재를 어찌 방랑시인으로 둘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그에 앞서 도사(道士) 오균(吳筠)과 옥진(玉眞) 공주도 황제에게 이백을 천거했는지라 현종제는 하지장이 이토록 이백을 극찬하는 것을 보고 끝내 이백이 재능이 넘친 인재임을 믿고 금전(金殿)에서 이백을 만났다. 금전에 들어 현종제를 알현한 이백은 즉석에서 현종제를 칭송하는 부를 써서 올렸다. 이백의 부를 읽은 현종제는 심히 기뻐하며 이백에게 맛 잇는 음식을 하사하고 몸소 국을 떠주었으며 한림공봉(翰林供奉) 벼슬을 내렸다. 한림공봉은 당현종이 공양하는 어용문인이었다.
꿈에도 바라던 벼슬을 받고 황제의 어용문인이 되는 크나큰 영광을 안았지만 이백은 더욱 우울했다. 그는 매일 하지장, 장욱과 함께 취하도록 술만 마셨다. 그리하여 당시 이백과 하지장, 장욱 등을 포함한 8명의 명사들을 사람들은 주중팔선(酒中八仙)이라 불렀다.
어화원에 모란이 만개한 어느 날이었다. 양귀비(楊貴妃)와 함께 침향정(沉香亭)에서 꽃구경을 하던 당현종은 갑자기 이백의 시와 이귀연(李龜年)의 노래를 듣고 싶어졌다. 내시 고역사(高力士)가 급히 사람을 보내 이백을 찾았는데 그 때 이백은 벌써 만취상태였다. 고역사는 하는 수 없어 이백을 들것에 담아 어화원으로 옮겼다. 당나라의 음주문화가 너무 발달해서일까? 당시는 술에 취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현종제는 이백이 술에 취해 일어서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해장국을 만들어 이백을 술에게 깨게 하라고 수라간에 명했다.
술에서 깬 이백은 꽃구경에 관한 시를 쓰라는 현종제의 말에 심기가 불편해졌다.
“어떻게 종 부리듯 오라 가라 하며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좋다. 네가 나를 종으로 여기면 내가 먼저 너의 측근과 후궁을 종으로 부려주마. 이렇게 오고 가야 예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이백은 술에 취한 척 하면서 고역사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겨주는 시중을 들게 하고 양귀비에게는 먹을 갈게 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 화를 참고 억지로 시중을 들자 이백은 그제서야 붓을 들어 단숨에 <청평조(淸平調)> 3수를 썼다.
구름은 그대의 옷인 듯, 꽃은 그대의 얼굴인 듯 한데(雲想衣裳花想容)
봄바람 난간을 스치고 이슬 맺힌 꽃은 영롱하기 그지없네(春風拂檻露華濃)
만약 군옥산 위에서 만나지 못한다면(若非郡玉山頭見)
달 밝은 요대의 달빛 아래서 만나리라(會向瑤臺月下逢)
현종제가 읽어보니 노랫말이 맑고 우아해서 기분이 심히 좋아 즉시 이귀연에게 그 노랫말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자신도 몸소 옥적(玉笛)을 불며 화합했다.
하지만 이백에게 놀림을 당한 고역사와 양귀비는 불쾌한 마음에 음악을 감상할 기분이 아니었다. 고역사가 낮은 목소리로 양귀비에게 말했다.
“마마, 두 번째 시는 뭐라고 썼는데요?”
활짝 핀 꽃 가지에 향기가 이슬에 맺혀(一枝濃艶露凝香)
비구름 되겠다던 무산선녀도 애간장 태우누나(雲雨巫山枉斷腸)
묻노니 한궁에서는 누가 양귀비 같이 아름다운가(借問漢宮誰得似)
아름다운 조비연도 몸단장 새로 해야겠다네(可憐飛燕倚新粧)
“잘 썼네요. 이백은 확실히 재자(才子)이군요.”
양귀비의 말에 고역사가 냉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이백은 마마를 화의 근원인 조비연에 비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화가 날대로 난 양귀비는 고역사의 말을 듣자 이백이 더 미워 애교를 부리며 현종제에게 말했다.
“폐하, 그만 불어요. 우리 이백에게 놀림을 당했어요.”
옥적을 내려 놓은 현종제가 웃으며 말했다.
“놀림을 당하긴, 그럴 리가 없소. 이백이 감히 짐을 놀려?”
“소첩이 조비연이면 폐하께서는 누구신데요? 아니, 이백은 우리를 놀린 게 아니라 우리를 욕한 거예요.”
현종제는 양귀비가 꼬투리를 잡는다고 여기면서도 이백의 시 중에 나오는 ‘비구름 되겠다던 무산선녀도 애간장 태우누나(雲雨巫山枉斷腸)’라는 구절이 좋은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다가 조비연까지 거든 것은 더욱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현종제는 이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집에 돌아온 이백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장안(長安)에 왜 왔는가? 나의 재능으로 나의 포부를 펼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나는 강태공(姜太公), 관중(管仲)과 같은 신하가 되고 싶은데 황제는 나를 놀이 상대로 여긴다. 황제의 마음 속에서 나는 악사인 이귀연보다 못할지도 모른다. 오늘 또 고역사와 양귀비에게 밉보였으니 장안에 오래 머물 수 있겠는가?”
저녁이 되자 이백은 정원의 우물가를 서성거리다가 방안에 들어와 등잔불 밑에서 책을 펼쳤으니 또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다가가 달을 바라보며 길게 탄식했다. 또 다른 일이 이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도교를 신앙하며 한 마음으로 신선이 되고자 수련하는 옥진공주는 이백과 뜻이 같았고 당시 아내와 사별한 이백은 옥진공주를 사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백은 그런 감정이 헛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낮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술이 깬 밤이면 밤마다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그 정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오늘, 벼슬을 그만 두고 장안을 떠날 생각을 하니 더욱 낙담과 실망을 동반한 이별의 슬픔이 이백의 가슴 속 깊이 스며들었다. 이제는 서로 멀리 떨어져 더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니 이백의 마음은 뜨끔뜨끔 아팠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연정을 시로 토로할 수밖에 없어서 이백은 밤새 서성이다가 그 유명한 <장상사(長相思)>를 썼다.
하염없이 그리나니(長相思)
장안에 계신 님(在長安)
가을 귀뚜라미 우물가에 울고(絡緯秋啼金井䦨)
차디찬 무서리에 대자리마저 싸늘하네(微霜凄凄簟色寒)
등잔불은 홀로 가물거리고 그리움에 넋을 잃어(孤燈不明思欲絶)
휘장 걷고 달 보며 괜스레 한숨 짓네(卷帷望月空長歎)
꽃 같은 미인은 아득히 구름 저 끝에 있건만(美人如花隔雲端)
위로는 높다라니 푸른 하늘(上有靑冥之高天)
아래는 출렁이는 맑은 물결(下有淥水之波瀾)
하늘 높고 길 멀어 혼백으로도 날지 못하고(天長路遠魂飛苦)
험난한 산에 막혀 꿈에서도 가지 못하네(夢魂不到關山難)
하염없이 그리다(長相思)
애간장이 끊어지네(催心肝)!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백은 변경에 가서 군인이 되어 공을 세우겠다고 황제에게 주청을 올렸다. 하지만 현종제는 윤허하지 않았다.
“그곳은 시인들이 갈 곳이 아니오.”
이백이 불복했다.
“왕한(王翰)과 왕지환(王之渙), 왕창령(王昌齡)도 시인들인데 변경에 가서 그렇게 많은 변새시(邊塞詩)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대는 그들과 다르오. 그리고 그대 나이에는 변경의 환경에 힘들 것이오.”
그 때 이백은 45살이었다. 황제의 말은 거절할 수 없었다. 나라를 위해 포부를 펼치려던 마지막 기회가 이렇게 사라지자 이백은 더는 한가한 어용문인으로 계속 남고 싶지 않았다. 이백이 재차 입산(入山)해 신선이 되는 도를 수련하겠다고 하자 현종제는 이번에는 흔쾌히 윤허했다. 그리고 많은 금은보화를 하사했다. 이는 아마도 고역사와 양귀비의 공로일 것이다. 이백을 멀리 쫓아 버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이백은 장안에 온지 3년도 안 되어 슬픈 가슴을 안고 부패하고 암담한 조정을 떠났다.
(다음 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