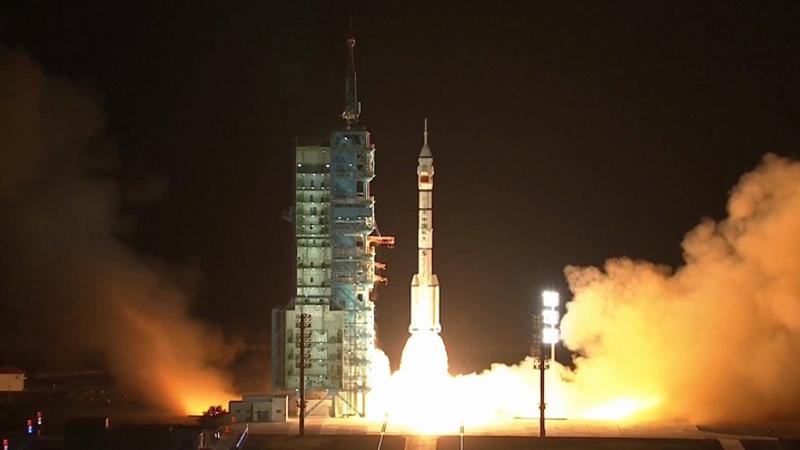(사진설명: 소동파의 석상)
제2회 죽을 고비를 넘기다
하늘에는 또 반달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소동파는 이번에는 일엽편주에서 달을 바라본 것도, 세차게 흐르는 장강에서 고향을 그리는 것도 아니라 물이 새는 배를 방불케 하는 감방에서, 세찬 파도가 치는 벼슬길에서 멸문지화를 눈앞에 두고 달을 바라보았다.
감방살이를 한 지도 어언 4개월에 가까워 오는 소동파는 모진 고문에 온 몸에 성한 곳 하나 없었다. 하지만 달과 끈끈한 인연을 가진 소동파는 달빛이 감방으로 비쳐 들어오자 정신을 차렸다. 몸을 일으켜 짚을 깐 바닥에 앉은 소동파는 달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 10년 간 경성을 떠나 항주에서 통판을 맡고 밀주(密州) 지주(知州), 서주(徐州) 지주, 호주(湖州) 지주를 맡으면서 벼슬길이 순탄하고 몸과 마음도 자유로웠다. 이제 나이 서른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큰 뜻을 품고 기백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 때 밀주에서 사냥을 하면서 격앙된 사(詞)를 썼었지.”
소동파는 저도 모르게 <강성자·밀주출렵(江城子·密州出獵)>을 읊었다.
나 잠시 소년의 광분을 토로하며(老夫聊發少年狂) 왼손으로는 누렁이를 끌고(左牽黃) 오른손에는 참매를 들고(右擎蒼) 비단모자 쓰고 담비 가죽옷 걸치고(錦帽貂裘) 말을 탄 일 천의 수종 거느리고 언덕을 휩쓰네(千騎卷平岡). 나를 따르는 온 성의 백성에게 보답하고자(爲報傾城隨太守) 반드시 호랑이를 쏘아(親射虎) 손권과 같은 모습 보이리(看孫郞).
술판 벌어지니 흉금은 더욱 활짝 열리고(酒酣胸膽尙開場) 귀밑 머리 살짝 흰 것(鬢微霜) 그깟 것 뭐가 대술꼬(又何妨)! 언제면 부절 잡고 구름 속에 갈꼬(持節雲中)? 한문제가 풍당을 파견한 것 처럼(何日遣馮唐). 둥근 달처럼 활을 한껏 당겨(會挽彫弓如滿月) 서북쪽 바라보며(西北望) 천랑을 겨누노라(射天狼).
호방한 시구가 아직도 머리 속에 메아리 치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오는 통증으로 소동파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또 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다.
“참으로 이상하다! 내가 호주에 온지 3개월도 안 되어 갑자기 하옥되었다. 어사(御史) 이정(李定)은 내가 시를 써서 사실을 왜곡하고 조정을 비방했다고, <항주기사시(杭州紀事詩)>를 증거로 무슨 ‘책은 만 권 읽었어도 법은 읽지 않아(讀書萬卷不讀律) 우리 임금을 요순으로 만들 수 없네(致君堯舜知無術)’라는 구절이 폐하가 법령으로 관리를 감독하지 못하고 재상이 성군을 보필할 능력이 없다고 조롱한 것이라고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나는 다만 내가 법을 잘 읽지 않아 폐하가 요순과 같은 성군이 되도록 보필할 수 없다는 말인데 말이다! 이정은 또 ‘어찌 공자마냥 좋은 음악 듣고 고기 맛 잊으랴(岂是聞韶解忘味) 석 달째 소금 없이 맨 밥으로 살았다네(迩來三月食無鹽)’는 신법을 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신법에 소금은 민간 거래를 금지하고 관가에서만 거래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정은 나의 이런 시가 나랏일을 비웃고 변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아, 변법이 관리들이 사욕을 챙기는 도구가 되어 백성은 살길을 잃고 사람들은 심지어 소금 살 돈도 없다. 이것이 사실인데 설마 사실을 말하지도 못한단 말인가?”
곁에서 달게 자는 흑의남(黑衣男)을 흘깃 쳐다본 소동파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오늘 들어왔는데 나하고 말도 걸지 않다가 내가 흰 쌀밥에 하얀 소금을 뿌리고 흰 무를 곁들이는 것을 보더니 ‘됐네. 밥은 잘 먹네’라고 말했다. 또 날이 어두워지자 내가 잠을 청하니 이번에는 혼잣말로 ‘잠도 잘 자는군’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아아, 아무튼 나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조정을 비방했다는 중죄를 인정하고 죽기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왜 하필 이 지저분한 감방까지 따라와서 난리인가?”
‘까아악~’
갑자기 감방 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푸드득 날갯짓 소리도 들렸다. 소동파는 까마귀가 불길한 징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상상의 나래를 폈다.
“사람들은 어사대(御史臺)를 오대(烏臺)라고 부르는데 잣나무를 많이 심어서인가? 과연 까마귀들이 좋아하는 곳이군 그려. 하하, 하늘땅을 덮은 까마귀 떼가 아침이면 날아 갔다가 저녁이면 돌아와 잣나무 가지에서 소란을 피우니 어사대는 참으로 오합지졸이 모이는 장소구나. 흥, 어사 이정의 됨됨이를 보아라! 어사들이 맨날 까마귀 주둥이로 시비를 일으키니 사람들이 어사대를 오대라 부르지 않겠는가?”
소동파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흑의남이 눈을 비비는 것을 보고 급히 자리에 누워 자는 척했다. 그런데 귓가에 그 흑의남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소 나리, 걱정 마시고 쉬십시오. 별일 없을 것입니다. 한 이틀 후면 황제의 조서가 내려올 테니 저는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소동파는 급히 다시 일어나 앉았다. 어렴풋한 새벽빛을 빌어 그 흑의남은 감방 문을 열고 조용히 가버렸다. 소동파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얼떨떨한 눈길로 흑의남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며칠 지나 과연 조서가 내려왔다. 소동파는 참형이 아니라 황주(黃州) 단련부사(團練副使)로 좌천되었다.
“정말로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구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았구나!”
소동파는 자신의 운이 좋다고 기뻐하면서도 수상쩍은 생각을 지우지 못했다. 소동파가 감방을 떠나기 전에 옥졸이 며칠 전 옥중에서 하루 밤을 함께 있은 그 흑의남이 황제의 측근 내시라고 몰래 알려주었다. 황제가 그를 보내 소동파가 옥중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소동파는 황제가 확실히 자신을 다르게 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소동파는 이미 수상(首相) 직을 내려놓고 강령(江寧)에 가 있던 왕안석이 황제에게 서신을 올린 것도 자신을 석방하는 데 한 몫 했다는 것은 몰랐다.
(다음 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