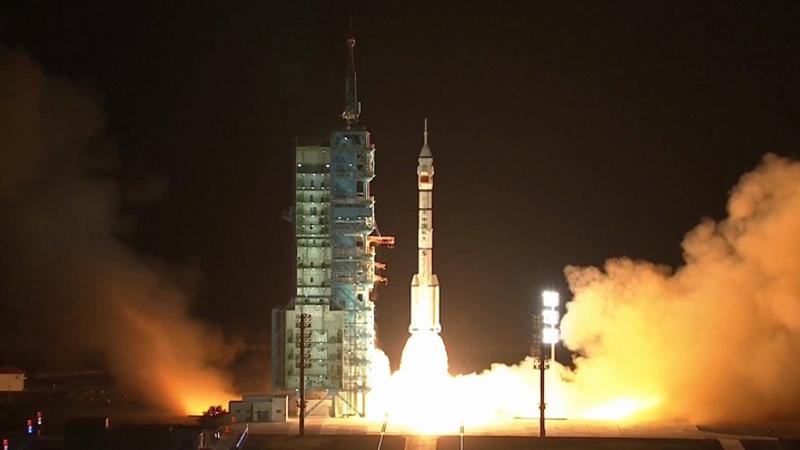(사진설명: 황도파의 밀랍상)
면방직의 비조 황도파
그녀는 목화재배 기술을 도입·전파하고 면방직 도구를 혁신해 목화씨를 빼내고 솜을 타고 실을 뽑고 원단을 짜는 일련의 방법을 고안했음은 물론이고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직기였던 삼정각답방차(三錠脚踏紡車)도 개발했다.
그녀가 전통기법을 기반으로 나뭇가지와 찻잎 등 온갖 모양의 무늬를 넣어 짠 ‘오니경피(烏泥涇被)’라는 이름의 면포(綿布)는 당시에 벌써 널리 알려져 면방직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녀가 바로 원(元)나라 초반의 여성 과학자이자 면방직의 비조인 황도파(黃道婆)이다. 황도파는 그녀의 본명이 아니다. 이름도 없는 평범한 여성인 그녀는 근면하고 용감하며 총명하고 사심이 없었다. 그녀의 노력으로 면포로 만든 옷이 베옷을 대신해 면방직물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면방직의 비조 황도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자.
제1회 민며느리 가출을 꿈꾸다
여기는 남송(南宋) 후반의 송강(松江) 오니경진(烏泥涇鎭), 오늘의 상해(上海) 화경진(華涇鎭)이다. 물론 당시는 아직 대도시 상해가 없었고 그 자리는 갯벌이 아니면 망망한 바다였을지도 모른다. 오니경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형상적이다. 7백년 후의 오늘날 이 이름만 들어도 검은 갯벌에 물길이 얼기설기하며 쪽배로 물길을 오가는 동네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하니 말이다.
당시 사람들은 바로 이런 황량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뽕나무와 누에 콩, 목화를 재배하며 고향을 가꾸었다. 하지만 벼와 밀 농사의 소출이 좋지 않아 사람들은 누에를 키우고 삼을 심어 비단과 베를 짜는 것으로 일상 소득을 늘렸다.
날은 어둡고 밤바람은 차가웠다. 어두운 등불이 가물거리는 방직 방에서는 천 년을 이어온 듯한 낡은 물레가 삐걱거리며 돌아갔다.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전혀 변함이 없는 무료하고 생기 없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밤에 실을 뽑는 여인은 이름도 없이 팔려온 민며느리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성씨가 황(黃)씨라는 것만 알아 아황(阿黃)이라고 불렀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읜 여인이 무엇으로 살아 가겠는가? 민며느리로 팔려와서 부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낮에는 옷을 빨고 밥을 짓고 밤에는 물레를 돌려 실을 뽑고 옷을 지어야 하는 아황은 손발이 쉴 틈도 없이 일을 해야 했지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가끔 매까지 맞아야 했다.
아황은 물레를 돌리면서 생각에 잠겼다.
“목화가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베를 뽑던 물레로 실을 뽑으니 무슨 좋은 실이 나오고 이런 실로 무슨 좋은 천을 짤 수 있겠어? 오늘 물가에서 빨래하다가 왕(王)씨네 부잣집 하녀 주(珠)가 면포(綿布)로 된 옷을 빨래하는걸 보았어. 그 면포야말로 좋았지 뭐야. 부드럽고 짜임새가 좋고 실밥도 없고 말이야. 그런 실은 어떻게 뽑고 그런 천은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몇 천 살이나 될지 모르는 이런 낡은 물레로는 뽑지 않았을 거야. 나는 실을 잘 뽑고 천을 잘 짜기로 유명한데도 말이다. 흥, 하늘의 직녀가 내려와도 이런 베틀로는 그렇게 예쁜 면포를 짤 수 없을 거야. 주가 그러는데 그 옷은 광동(廣東)의 상인에게서 산 길패(吉貝)라는 천으로 지었다고 했어. 광주(廣州)인들도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애주(崖州)의 여족(黎族)인들만이 그렇게 좋은 길패를 짠다고 들었지. 아아, 길패라는 이름은 듣기에 좀 이상해. 그건 아마도 여족인들이 면포를 말하는 것일 거야.”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아황은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지금 나는 소나 돼지보다도 못하게 사는데 광동이나 애주로 가는 상선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몰래 그 배를 타고 광동이나 애주로 가게 말이야. 그 곳에 가서 천을 짜는 기술도 배우고 이놈의 집도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디를 가든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거야.”
아황은 이런 담대한 생각을 하는 자신에 깜짝 놀랐다.
“수중에 돈 한 푼 없는데 누가 나를 광주나 애주에 데려다 주겠어? 혹시 인적도 없는 무인도에 나를 던져 버리면 굶어 죽을 수 밖에 없을 거야. 또 기생집에 팔아 버리면 죽기만도 못할 거구! 내가 너무 엄청난 생각을 한거 아니야?”
아황은 곧 이어 머리를 흔들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일을 하는데 왜 위험이 없겠어? 새 삶을 살고 재주를 배우는데 이것 저것 재서야 무슨 일을 하겠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구? 해야겠다! 두려울 게 뭐야? 기껏해야 죽는 거겠지? 지금처럼 살 바엔 죽기보다도 못해.”
“아황, 등잔기름은 공짜냐? 실 한 타래를 뽑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오래 걸려! 얼른 자지 못할까! 내일 아침 부두에 쌀 가지러 가야 하잖아. 내일 늦으면 네 년은 죽은 목숨이야!”
시어머니의 욕설이 들려오는 바람에 아황은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다. 머리를 숙여 보니 벌써 실 한 타래를 다 뽑았다. 그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다.
시아버지가 사전에 약속한 쌀을 받기 위해 이튿날 날이 밝자 오송강(吳淞江) 나루터에 나온 아황은 외지에서 온 배들을 눈 여겨 보며 광주에서 온 상선을 찾으려 했다. 강에는 적지 않은 배가 정박했지만 아황은 그 배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냥 쌀을 싣고 온 배가 무석(無錫)에서 왔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이 때 아황은 한 짐꾼이 ‘길패’ 면포를 어깨에 메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아황은 급히 다가가서 물었다.
“아저씨, 이 천은 어디서 왔나요?”
짐꾼은 아황이 여자인걸 보고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다.
“애주에서 왔단다.”
아황은 신나서 또 물었다.
“어느 배가 싣고 왔나요?’
짐꾼이 손으로 얼굴의 땀을 훔치고 나서 가리켰다.
“저기 저 쌍 돛배야. 지금 강에는 쌍 돛대를 단 배는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아황이 짐꾼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보니 과연 키 높은 돛대 두 개를 단 큰 범선이 정박해 있었다! 아황이 인사를 하기도 전에 짐꾼은 급히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아황은 이렇게 생각했다.
“정말로 좋은 기회야. 저 배가 오늘 저녁에 돌아가는 건 아닌지 잘 알아봐야겠어. 그리고 빨리 움직이자.”
(다음 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