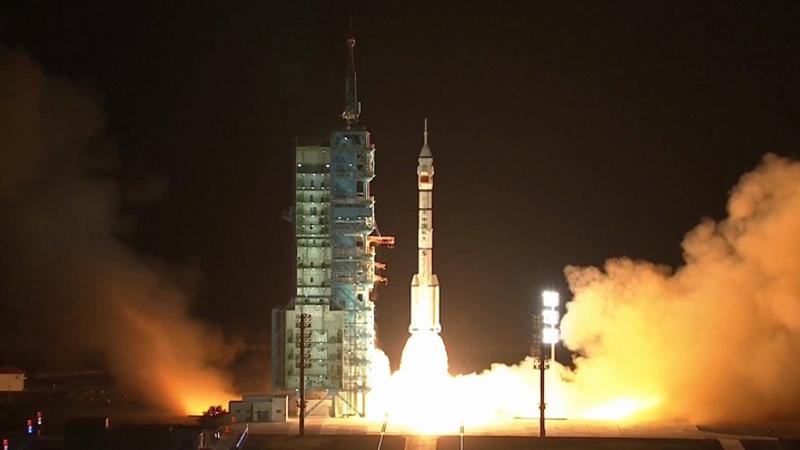(사진설명: 출간된 <서상기> 도서)
제2회 작품을 구상하는 극작가
오늘의 베이징(北京)을 말하는 원(元)의 국도, 대도(大都)의 서사(西四) 전탑후퉁(磚塔胡同)에는 확실히 구란와사(勾欄瓦舍)가 적지 않았다. 구란와사란 극장을 말한다. 대도에서 가장 유명한 화류계이기도 한 그곳에는 가기(歌妓)와 관기(官妓)가 많았고 따라서 기녀들을 위해 잡극(雜劇)을 쓰고 산곡(散曲)을 짓는 문인들도 적지 않았으며 연극을 보고 배우들의 뒤꽁무니를 쫓는 부잣집 도련님들도 있었다. 물론 정인을 찾아 다니는 글쟁이들도 많았다.
잠깐 잡극과 산곡을 알아보고 넘어 가자. 원나라를 대표하는 문학예술 중 하나인 잡극은 노래와 무용, 연기를 통합한 중국의 전통 희곡이고 가사를 말하는 산곡은 송(宋)의 사(詞)를 이어 발달한 원나라 때의 시가인데 음악에 맞추어 노래하는 양식 부분에서는 잡극과 유사해서 산극과 잡극은 원곡(元曲)으로 통칭되기도 한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인종 차별화 정책을 시행한 원(元) 나라는 등급이 삼엄하고 존비(尊卑)가 딱 갈리는 봉건사회였다. 원 조정은 1등 몽골인, 2등 색목인(色目人), 3등 한인(漢人), 말등 남인(南人)으로 민족을 구분하여 차별 대우했다. 게다가 신분에도 차등을 두어 직종에 따라 사람들을 아홉 가지 부류, 즉 구류(九流)로 나누었는데 일관(一官), 첫 번째는 관리이고 이리(二吏), 두 번째는 서리이며, 삼승(三僧), 세 번째는 불교의 승려, 사도(四道), 네 번째는 도교의 도사(道士), 오의(五醫), 다섯 번째는 의사, 육공(六工), 여섯 번째는 기술자, 칠렵(七獵), 일곱 번째는 사냥꾼, 팔민(八民), 여덟 번째는 농민, 구유(九儒), 아홉 번째는 선비, 십개(十丐), 제일 말단 직업은 거지였다.
이런 규정에 의하면 당시 선비에 속하는 문인과 거지에 속하는 기녀는 모두 제일 미천한 직업, 즉 하구류(下九流)에 속했다. 2등 인종인 색목인이자 1등 직업의 관리인 왕실보가 벼슬을 내놓고 화류계를 찾는다는 것은 스스로 최고 레벨에서 말단 직으로 내려와 사회의 밑바닥에서 거지나 기녀들과 노래를 부르며 세월을 보내겠다는 것이니 그의 부모가 정신을 잃을 만도 했다.
사실 왕실보가 벼슬을 그만 둔 것은 구란의 한 기녀와 연관된다. 왕실보는 반아(盼兒)라고 하는 용모도 예쁘고 목소리도 고운 기녀에게 푹 빠졌던 것이다. 왕실보는 배우의 뒤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그런 도련님들과는 달리 연극의 동호인이자 작가였으며 반아와 뜻도 같고 서로를 좋아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아내도 있고 벼슬도 가진 왕실보였으니 반아를 위해 산곡과 잡극을 쓰고 그녀와 함께 연극무대에 오를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병사하고 또 상급자와 말도 통하지 않으니 이 때 아니면 언제 인생의 길을 바꾸겠는가? 그리하여 왕실보는 대도에 돌아오자 먼저 관한경이 세운 잡극의 공연장소인 옥경서회(玉京書會)를 찾아갔다가 반아를 만난 후에야 귀가했던 것이다.
그날부터 왕실보는 ‘옥경서회’를 집으로 삼을 정도로 매일 그곳에서 관한경 등과 극본을 논의하고 곡조를 연구했으며 주렴수(朱簾秀)와 반아 등 기녀들도 늘 그곳에서 신곡을 부르고 신극을 공연했다. 왕실보는 신나고 기분이 좋았다.
어느 날, 왕실보가 몰래 반아를 찾아 말했다.
“오늘 저녁 달도 좋으니 우리 갈 데가 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미소를 머금은 반아가 머리를 끄덕였다.
달이 뜨자 왕실보는 반아를 데리고 강변에 나가 쪽배에 올랐다. 여름 밤의 강물은 고요하게 흐르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왔다. 살랑살랑 다가와 배전에 부딪치는 물결이 마음을 설레게 했다. 왕실보는 쪽배가 강물을 따라 흐르게 놔두고 반아를 껴안고 속삭였다.
“섬서(陝西)에 있을 때 적지 않은 곡을 썼는데 불러 볼게 들어봐.”
“제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구요?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거 아니예요?”
“내가 써서 내가 부르는 건 내 마음의 소리이니 연극과 다른 거다.”
반아가 머리를 끄덕였다.
“맞네요. 그럼 어디 한 번 마음의 노래를 불러봐요.”
왕실보는 낮은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다.
하늘은 씻은 듯 맑고 은하수 그림 같은데 밝은 달빛 비추어 정원엔 꽃 그림자 가득하네. 찬 바람 비단 옷깃 날려 마음을 가다듬은 여인 귀 기울여 발끝 걸음으로 종종 가며 고요하게 그 누구를 기다리네.
한가롭게 녹수청산 마주하니 지친 마음 피곤한 눈 시원하게 하네. 어느새 호랑이 굴에서 나와 고요한 어촌에 이르니 삿갓 쓰고 도롱이 입고 바람과 가랑비 막네. 이제부터 거문고 타고 술 자작하며 자유롭게 노래하고 춤 추리라.
왕실보의 노래가 한 단락 끝나자 반아가 웃었다.
“나리는 이렇게 벼슬을 하셨어요? 매일 산에 들에 나가 놀며 술 마시고 거문고 뜯으면서요?”
“하얀 은하수 반짝이고 밝은 달이 중천에 뜨면 나는 언제나 너를 그리워 했다. 산수를 즐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거문고를 뜯지 않으면 나는 아마 벌써 죽었을걸?”
“알아들었어요. 나리 마음의 적막, 나리 마음의 고독을. 하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것인지 사람을 그리는 것인지는 모르죠.”
반아의 말에 왕실보가 대꾸했다.
“그런 한 곡조 더 들어보거라. 그럼 알 것이다.’
어스름한 푸른 등잔 마주하고 차가운 낡은 병풍에 기대니 불빛은 어둡고 꿈은 오지 않네. 성긴 창살 사이로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종잇장 흔드는데 베개는 홀로 기댈 곳 없고 이불 속은 적막하기 그지없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도 연정 품으리.
반아가 어리광을 부리듯 말했다.
“이건 나리가 아니예요. 이건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나리를 그릴 때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리는 거다. 사실 나를 그리는 너의 마음도 나처럼 이럴까 하고 늘 생각했다. 이제 보니 과연 그렇구나.”
“남자와 여인이 사람을 그리는 건 서로 달라요. 밤에 잠들지 못하고 창살에 불어오는 바람에 창호지 울면 밤이 유난히 그윽하고 마음도 더욱 외로운 건 여인들에게만 있는 느낌이에요.”
“나는 바로 너의 이런 느낌을 찾는다. 하지만 나도 이런 느낌이야. 남자는 간혹 여인보다 더 고독을 느낄 때가 있다. 한 곡 더 들어보거라. 이건 너의 느낌인지 나의 느낌인지 잘 듣거라.’
너하고 헤어진 뒤로 끝없이 펼쳐진 산 몽롱하고 맑은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만 가네. 날리는 버들개지 하얀 파도인가 화사한 복사꽃은 얼굴에 어린 홍조이런가. 규방에선 향기로운 내음 풍겨 나오고 두터운 문은 황혼까지 굳게 닫혀 있는데 빗방울 방문을 두드리네. 황혼이 올까 두려워하니 오히려 황급히 다가오는 황혼에 어찌 넋을 잃고 슬퍼하지 않으랴? 방금 흘린 눈물자국 마르기도 전에 또 눈물이 흘러 괴로운 사람 괴로운 이를 그리네. 올 봄에 내가 얼마나 야위었는지 아나요? 옷고름 세 치나 넓어졌어요.
“이것도 내가 나리를 그리는 거예요. 나리가 나를 그리는 것이 아니예요.”
반아의 말에 왕실보가 웃으며 대꾸했다.
“사실 모두 내가 너를 그리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그리는 것이라면 이제 쓸 잡극은 아마도 단본희(旦本戱)가 되겠구나.”
단본희는 잡극에서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극을 말한다. 이와 달리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잡극은 말본희(末本戱)이다.
“좋아요. 단본희를 쓰면 내가 할게요. 나는 이런 곡조를 좋아해요.”
반아의 말에 왕실보가 말을 이었다.
“나는 <회진기(會眞記)>를 개편하겠다. 양이 많아서 한 본(本)으로는 끝나지 못할 것이다. 5본(本) 20절(折)을 쓸 것이다. 그러니 어찌 주역 한 명이 다 부를 수 있겠느냐? 나는 전례를 깨고 단본희든 말본희든 극 중 배역이면 모두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 물론 주인공은 남자와 여자 둘이고. 네 생각은 어떠냐?”
“네. 좋아요! 잡극은 항상 1본 4절에 그치고 주역만 노래를 부르니 풍성하지 못하긴 해요.”
“좋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회진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거야.”
반아는 그제서야 문득 무언가를 깨닫고 물었다.
“나리께서 하실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왕실보는 머리를 끄덕이며 자랑스럽게 웃었다.
(다음 회에 계속)